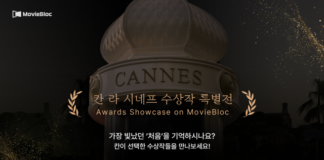오랜 세월 한국의 수도 서울의 중심이었던 명동, 경제의 중심 정치의 중심 패션과 유행의 중심지였다. 중년들에게 명동은 초입의 코스모스 백화점을 우선 떠올리게 하고 사보이호텔과 메트로호텔 그리고 당대 최고의 디제이 ‘이종환’의 쉘부르를 떠올리게 한다. 6.25 전란도 비켜갔다는 명동성당과 그 바로 앞의 YWCA건물, 충무로 방향으로 내려가면 시선을 붙잡곤 하던 중앙극장 그 시절 우리가 명동을 찾는 이유였다.
경제가 발전하고 도시가 분화되면서 여의도로 압구정으로 로데오 거리로 또 전철역 마다 생겨난 먹자골목으로 명동의 기억이 옅어져만 가던 90년대부터, 명동은 떠나버린 한국인에게의 미련을 버리고 대신 일본관광객과 중국관광객의 눈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지난 주 다시 찾은 명동은 분주하고 활기 가득했다. 밀레오레 명동의 뒷길로부터 골목골목을 되짚으며 예전의 기억과 크게 달라진 오늘을 비교해 보았지만 여전히 명동은 매력적인 곳이다. 젊은 날의 우리 대신 세계 각국으로부터 찾은 관광객들이 있을 뿐 아직 그곳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의 예쁜 안내원은 1일 400-500명이 도움을 청해 온다면서 명동이 관광의 명소가 된 것은 ‘한류의 영향으로 패션의 중심이며 한국을 방문할 때 반드시 가봐야 할 곳’ 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때 가장 명소였던 이태원의 자리를 명동이 완벽히 대신한 것은 외국관광객들이 손쉽게 남대문 동대문 청계천 경복궁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를테면 관광의 허브 역할이 가능한 것도 이유일 것이다.
명동을 한국 관광의 메카로, 관광경제의 중심으로 유지 발전시켜 가려고 한다면 명동의 역사를 보여 줄 수 있는 박물관과 한국의 현대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문화예술관이 자그마하게 라도 함께 하고 소규모라도 전시와 공연이 이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명동에서 또 다른 서울의 명소 청계천은 지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