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원=박예슬 기자] 기축년 ( 己丑年 ) 인 1589 년 ( 선조 22) 정여립 ( 鄭汝立 ) 이 반란을 꾀하고 있다는 고변 ( 告變 ) 은 동인 1,000 여 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정여립은 천반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 그가 “ 천하는 공물로 일정한 주인이 있을 수 없다 ”, “ 누구를 섬기든 임금이 아니겠는가 ” 하며 결성한 대동계는 해체되었다 . 이 사건을 계기로 서인은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동인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
[미디어원=박예슬 기자] 기축년 ( 己丑年 ) 인 1589 년 ( 선조 22) 정여립 ( 鄭汝立 ) 이 반란을 꾀하고 있다는 고변 ( 告變 ) 은 동인 1,000 여 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정여립은 천반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 그가 “ 천하는 공물로 일정한 주인이 있을 수 없다 ”, “ 누구를 섬기든 임금이 아니겠는가 ” 하며 결성한 대동계는 해체되었다 . 이 사건을 계기로 서인은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동인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
정여립은 1570 년 문과에 급제한 후 , 예조 좌랑 , 홍문관 수찬 등을 지내며 동인의 중심인물로 떠올랐으나 , 벼슬을 그만두고 홀연히 고향인 전주로 내려가 , 진안 죽도에 서실을 짓고 대동계를 조직했다 . 대동계는 군사훈련도 함께 받았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 1587 년 전주부윤의 요청으로 정여립은 대동계원들과 함께 전라도 도서 지방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기도 했다 . 그러나 1598 년 황해감사 한준 , 안악군수 이축 , 재령군수 박충간 등이 정여립이 대동계와 함께 모반을 꾀하고 있다고 선조에게 고변을 했다 . 정여립은 체포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죽도에서 자결했다 .
제 3 회 혼불문학상 수상작 ‘ 홍도 ’ 는 기축옥사로부터 시작된 개인의 사랑과 슬픔을 400 여 년 시간 동안 거침없이 끌고 간다 . 정여립의 외손녀 , 홍도라는 여인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큰 상처인 기축옥사에 휘말려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잃는다 . 그녀는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으며 400 여 년의 시간을 홀로 살아간다 . 그녀에게 역사란 늘 반복되는 거대한 슬픔일 뿐이다 . 그녀는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어느 땅에서 다시 태어날 자신의 사랑을 찾아 떠돈다 . 모반과 전쟁 , 권력의 박해 속에서도 홍도는 오직 사랑을 원한다 .
세상이 어지럽다 . 정치권의 권력 다툼 , 좌우의 대립 , 경제난 등 일상에 어지러운 사건이 가득하다 . 이런 상황에서 김대현 작가의 ‘ 홍도 ’ 의 인기는 주목할 만하다 . 먹먹하게 가슴을 울리며 , 자신 안의 사랑을 돌아보게 하는 힘이 제 3 회 혼불문학상 수상작인 ‘ 홍도 ’ 에 있다 . 정여립은 죽고 역사의 상처는 계속되지만 , 사랑은 불변하여 마음을 울린다 .
코스모스팜 소셜댓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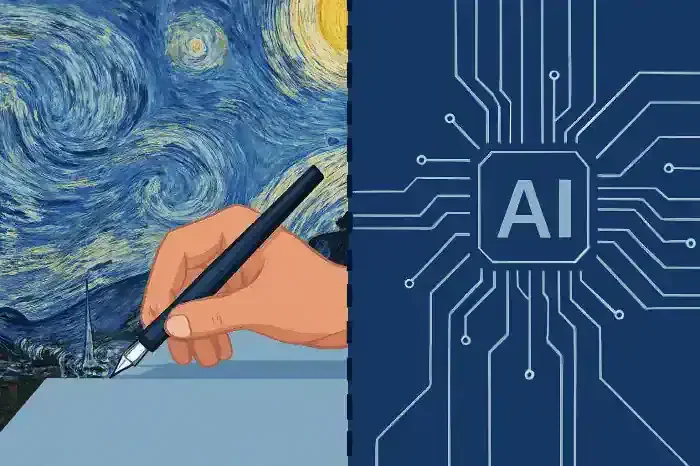
![[기획시리즈 | 한국사회와 노인] ② 창업이 아니라 추락이었다](https://media1.or.kr/wp-content/uploads/2025/06/A꾸미기85c7f0e2-cc2b-466a-b0f4-467a3300eb10-100x7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