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나라에 가나, 저마다 나름의 이유와 사정을 가지고서 꼭 있는 음식이 바로 ‘면 요리’다. 대부분 곡식을 이용해서 만드는 면 요리들은, 자연스럽게 곡식의 주인인 서민의 음식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각 나라마다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서 존재하는 면 요리는 한국 안에서도 그 유래와 맛, 모양이 천차만별! 대한민국 누들기행 그 세 번째, 부산의 ‘밀면’과 포항의 ‘모리국수’의 참 맛을 찾아 ‘후루룩’ 길을 나선다.
# 냉면 사촌 ‘밀면’이 탄생하다!
‘부산하면 해운대’라는 진리를 거스르지 않고 ‘부산밀면’을 찾아 가는 첫 번째 여행지로 해운대를 선택했지만, 사람들이 흘러넘치는 해운대의 익숙한 광경은 보고 싶지 않았기에 아침 일찍 길을 나섰다. 해운대에 일찍 도착한 탓인지 TV에서 보던 해운대의 편파적인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고 그 대신 여느 바다와 마찬가지로 한적한 아침 바다의 광경을 보게 되는 행운을 얻었다. 그래, 이래야 공정하다. 해운대도 해안선을 물들이며 솟아오르는 태양이 있고, 바다가 스스륵 회수해 가는 고요한 파도소리가 있음을.
해가 떠 태양에 반짝거리는 모래가 모습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서서히 몰려들기 시작하자, 여행의 목적이었던 부산밀면이 퍼뜩 떠오른다. 부산식 냉면인 밀면의 역사는 6·25 전쟁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으로 몰려온 피난민들은 대개 산꼭대기나 바닷가 근처에 집단 거주지를 형성했는데 대표적인 거주지가 중구 영주동과 동광동 산꼭대기였고, 이 외에도 영도 신선동과 청학동 산꼭대기나 우암동 산꼭대기, 서구 감천동 산꼭대기에서도 거주했다. 밀면은 바로 이 피난민 거주지에서 처음 태어나게 됐다. 이북 출신의 피난민들이 북한에서 먹던 냉면을 만들어 먹고 싶었지만, 주재료인 메밀을 구하기가 힘들어 밀가루로 냉면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그 유래가 된 것이다. 당시 밀가루는 미군부대에서 풍족하리만큼 나눠줬기 때문에 손쉽게 구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시도는 몇 차례의 실패 끝에 밀가루와 옥수수 전분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 면을 만들어냄으로써 성공을 거두었고, 처음에는 ‘밀냉면’, ‘부산냉면’으로 불리다가 ‘부산밀면’으로 이름이 굳어졌다.

부산에서 밀면의 원조로 꼽히는 ‘내호냉면’을 찾아가기 위해 우암동으로 가는 길은 멀지 않았고, 해운대에서 10분정도 차를 타고 도착한 내호냉면집에는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집이 왜 그렇게 유명한지 물어보았더니 함경도에서 냉면 장사를 하던 가게 주인의 시어머니의 시어머니가 부산으로 피난을 와 이 냉면집을 열게 되었고, 지금 주인은 3대 사장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벌써 60년 정도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맛집에서 고민하지 않고 밀면을 주문했더니, 물 밀면과 비빔밀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 냉면에서 탄생한 요리라는 점을 확실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하나를 선택하라니, 이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짜장면과 짬뽕, 양념치킨과 프라이드치킨 사이의 딜레마와 같았다. 이럴 때는 그저 ‘짬짜면’처럼 둘 모두를 먹어주면 되는 것이다.
드디어 주문했던 밀면들이 나왔다. 빨간 양념장과 함께 오이와 계란이 가지런하게 올려져 있는 모습이 냉면과 판박이 같지만, 면발의 색은 우리가 알던 그 냉면의 색이 아닌 약간은 노르스름한 색을 띠었다. 그 맛은 어떨까.
‘후루룩.’ 먼저 물밀면이다. 국수보다 쫄깃하면서 냉면보다 부드러운 면의 식감이 입에 착착 감겼다. 육수는 익숙한 맛이지만, 양념장에 무슨 비법이라도 있는지 식당에서 먹던 조미료 맛이 아닌, 감칠맛 나고 구수한 향이 입 안을 상쾌하게 감돈다. 비빔밀면은 경상도의 대부분의 음식들이 짙은맛을 내는 특성을 닮아, 일반 비빔냉면보다 새콤달콤하다. 냉면의 질긴 식감이 없어 힘들이지 않고도 잘 씹히고 목구멍으로 꿀떡꿀떡 넘어가는 것이 식욕을 더 돋운다. 정신없이 맛 본 부산 밀면, 한국 누들계의 진정한 최강자였다.
# “해물 다 모디라!”
부산밀면을 맛보았으니, 이제는 포항의 ‘모리국수’ 차례다. 포항까지는 차를 타고 이동하면 부산에서부터 2시간 정도로 드라이브라고 생각하고 길을 다선다면 그리 오랜 시간은 아니다. 모리국수를 맛보기 위해서는 구룡포로 가야하지만, 부산밀면을 먹은 지도 얼마 안됐고 해서 구룡포 가는 길에 있는 북부해수욕장과 환호해맞이공원을 들르기로 했다. 피서객이 많이 몰릴 시기였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해수욕장이고 늦은 오후라 그런지 생각보다 한산한 모습이다. 모래가 너무 고와 보여 맨발로 발자국을 남기며 뛰어다녀 본다. 해수욕장과 5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해맞이공원은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천천히 산책하며 구경하기에는 제격 이었다.

이제 원래의 여행 취지를 다시 떠올려 구룡포로 이동, 구룡포까지는 1시간 정도 소요됐다. 도착한 구룡포항에는 고기를 잡으려는 배들이 샐 수 없이 묶여 있다. 바로 이곳에 우리 가찾으려는 맛, 어부들이 먹던 소박한 국수, 모리국수가 있다. 모리국수라는 이름의 유래는 여러 가지다. 구룡포는 일제 강점기 때 신사가 지어질 정도로 많은 일본인들이 살았고, 그 때문에 일본인의 근거지로 자리 잡게 됐다. 따라서 어느 지역보다 일본어가 흔하게 쓰였다고 한다. 일본에는 보통보다 많이 담는다는 뜻으로 쓰는 ‘모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뜻대로 한다면 모리 국수는 보통보다 많은 양의 국수가 된다. 실제로 모리국수는 셋이 가서 2인분을 시켜도 3인분 이상의 양이 나오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셈이다. 또 다른 유래로는 경상도 사투리 중 ‘모디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표준어로 ‘모아라’라는 말이다. 국수에 여러 가지 해물을 ‘모디었다’해서 ‘모디국수’였다가 발음 상 ‘모리국수’라고 불리게 됐다는 말도 있다.
구룡포에서 모리국수 집으로 가장 유명한 식당이 구룡포 읍내에 있는 ‘까꾸네 모리식당’ 이라는 소문을 듣고 길을 물어 찾아 갔다. 주인 어르신에게 언제부터 이곳에서 모리국수를 팔게 됐는지 묻자, 처음에는 모리국수가 이름도 없었던 음식이라고 하며, 어부들이 어판장에서 팔고 남은 생선을 판잣집으로 가져와 국수를 넣고 끓여달라고 해서 만들어 준 것이 모리국수의 시작이라고 한다. 여러 사람들이 싱싱한 생선을 ‘모디가’ 먹었던 것이 그 시작이었던 셈이다.
주문한 모리국수는 그 양부터 환호성을 지르게 했다. 모락모락 김이 나는 큰 냄비에 해산물과 호박, 파, 양파와 같은 야채가 넘치도록 듬뿍 담겨져 있고, 무엇보다 고춧가루를 확 풀어 팔팔 끊인 걸쭉한 국물이 ‘시원하다’는 말을 절로 나오게 만들었다. 깔끔 떨며 먹는 요리가 아니라 여럿이 숟가락을 들고 왁자하게 달려들어 쟁탈전 벌이듯 먹어야 제 맛인, 참으로 뱃사람과 안성맞춤인 음식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다.
모리국수에 들어가는 생선은 한가지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철마다 잡히는 생선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생선을 쓰는데 주로 매운탕용으로 많이 쓰이는 흰살 생선인 바다메기, 아귀, 우럭 같은 생선이 많이 쓰인단다. 대게와 다시마로 육수를 내고 바다메기, 미더덕, 대게 등이 들어간 모리국수는 먹으면 먹을수록 그 맛에 빠져든다. 고춧가루 양념을 진하게 풀어낸 칼칼한 국물은 시원하고 얼큰해 먹는 내내 땀이 난다. 아삭하게 씹히는 콩나물도 국수와 잘 어울리고, 살이 통통한 생선을 그대로 먹으니 국수를 먹는 건지 매운탕을 먹는 건지 헷갈릴 정도다. 커다란 양은냄비에 넘치듯 푸짐하게 끓여내, 어민들의 뱃속의 채워줬던 별미 중의 별미 모리국수가 아직도 포항 구룡포 앞바다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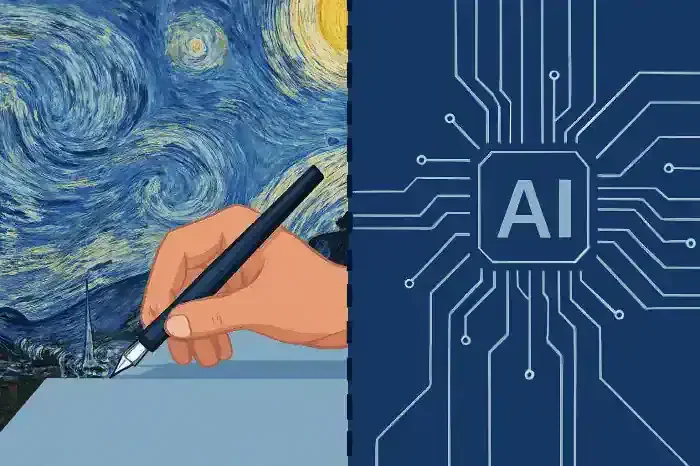
![[기획시리즈 | 한국사회와 노인] ② 창업이 아니라 추락이었다](https://media1.or.kr/wp-content/uploads/2025/06/A꾸미기85c7f0e2-cc2b-466a-b0f4-467a3300eb10-100x7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