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수원시에서 식당을 하는 김모(50)씨는 지난 9월 중순 새벽 5시쯤 집에서 심한 구역질을 하며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신고 후 9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심전도를 봤더니 심장 박동 없이 심장이 부르르 떨기만 하는, 사망 직전에 보이는 부정맥이 나왔다. 심정지 상태나 다름없었다. 구급대원은 즉시 병원에서 쓰는 전기쇼크기로 충격 치료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스마트폰 영상 통화로 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의 지도를 실시간으로 받았다. 그 지시에 따라 구급대원은 강심제 에피네프린과 부정맥 치료제 리도카인을 수차례 투여했다. 총 15차례의 전기쇼크 치료와 구급대원 6명이 돌아가며 44분에 걸쳐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끝에 김씨의 심장 박동과 혈압이 기적적으로 돌아왔다. 그는 나중에 신경학적 손상 없이 회복돼 현재 식당업을 계속 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식당을 하는 김모(50)씨는 지난 9월 중순 새벽 5시쯤 집에서 심한 구역질을 하며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신고 후 9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심전도를 봤더니 심장 박동 없이 심장이 부르르 떨기만 하는, 사망 직전에 보이는 부정맥이 나왔다. 심정지 상태나 다름없었다. 구급대원은 즉시 병원에서 쓰는 전기쇼크기로 충격 치료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스마트폰 영상 통화로 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의 지도를 실시간으로 받았다. 그 지시에 따라 구급대원은 강심제 에피네프린과 부정맥 치료제 리도카인을 수차례 투여했다. 총 15차례의 전기쇼크 치료와 구급대원 6명이 돌아가며 44분에 걸쳐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끝에 김씨의 심장 박동과 혈압이 기적적으로 돌아왔다. 그는 나중에 신경학적 손상 없이 회복돼 현재 식당업을 계속 하고 있다.
이 환자의 심정지가 만약 올봄에 생겼다면 그는 아마도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 중앙소방본부, 수원시 119구급대, 아주대병원 응급센터가 지난 7월부터 혁신적인 심정지 처치 체계를 구축한 덕에 생명을 건진 것이다.
수원시에서는 지난해 심정지 환자가 417명 발생했다. 살아서 병원을 나간 생존 퇴원율이 약 3%에 불과했다. 100명 중 한 명만이 신경학적 손상 없이 살았다. 구급대원은 적은데, 출동 지역은 넓어 구급대 처치 능력이 분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수원시 구급대와 아주대병원은 역발상을 시도했다. 심정지로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구급대 출동 규모를 두 배로 늘렸다. 구급차 1대에 3명 출동하던 것을 2대 6명 체제로 갖췄다. 심박동이 돌아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현장에서 충분히 하기 위해서였다. 2인 1조가 심폐소생술을 5분만 해도 지쳐서 기존에는 현장 심폐소생술 시간이 평균 9.8분에 불과했다. 반면 새로운 체제 덕분에 김씨는 44분의 소생술을 받고 살아났다.
또 구급대원들은 정맥 수액 투여, 심장 약물 주입, 인공 기관지 삽입 등 의사 수준의 응급처치를 훈련했다. 전기쇼크기도 병원에서 의사들이 쓰는 것을 구급차에 갖고 다녔다. 응급의학과 의사와 실시간 영상 통화 지도를 받는 방식도 연습했다. 응급실을 심정지 처치 현장에 옮겨 놓은 셈이다.
지난 7월부터 11월 말까지 발생한 심정지 환자 111명에게 새 방식의 처치를 한 결과는 놀라웠다. 현장에서 심장 박동이 돌아온 경우가 21.6%로 예전(4.2%)보다 다섯 배 늘었다. 특히 신경학적 손상 없이 회복돼 걸어서 퇴원한 비율이 8.1%로 기존보다 8배가량 증가했다. 현장에서 심장 박동이 조기에 돌아온 결과다. 이는 미국·일본 등 응급 의료 선진국 7~9%와 같은 수준이다. 생존율(9.9%)도 3배로 높아졌다.
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김기운 교수는 "심정지 후 살아나더라도 식물인간이 되거나 여생을 요양병원 신세를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응급처치는 신경학적 손상을 최대한 줄이며 소생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이 기간 생존자 11명 중 절반은 새 방식 덕에 목숨도 건지고 후유증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중앙소방본부 119구급과 최용철 구급기획계장은 "심정지 환자 가족들이 구급대원에게 빨리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재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오히려 생존율을 떨어뜨린다"며 "현장에서 충분히 전문적인 심폐 소생 처치를 하도록 구급대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신경학적 후유증 없이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코스모스팜 소셜댓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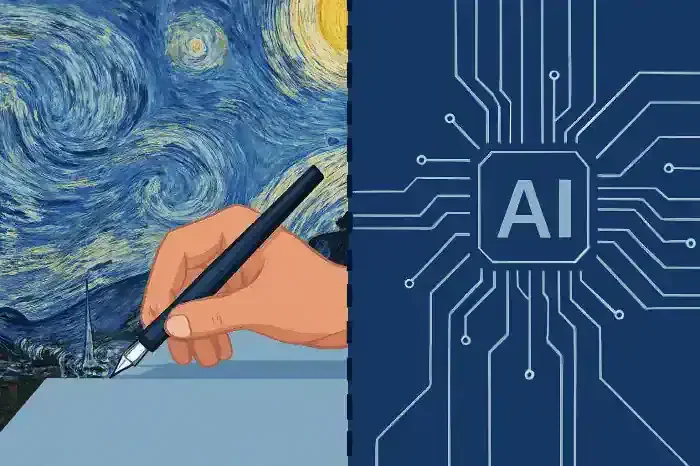
![[기획시리즈 | 한국사회와 노인] ② 창업이 아니라 추락이었다](https://media1.or.kr/wp-content/uploads/2025/06/A꾸미기85c7f0e2-cc2b-466a-b0f4-467a3300eb10-100x7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