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43년 세종이 기획, 창제한 훈민정음은 조선의 아득한 어둠을 밝힌 혁명이다.
혜각존자 신미는 기록되지 않은 혁명의 핵심 편집인이다. 우주로 피워 올린 꽃, 훈민정음 속에는 깨달은 이의 땀과 눈물과 고통이 녹아들어 있다. 훈민정음 창제 사실의 앞과 뒤가 은밀한 힘에 의해 잘려나가듯 혜각존자의 자취 또한 역사의 행간 속에서 홀연, 사라졌다.
571년이 지난 오늘, 지은이 박해진은 신미스님의 발자취를 남김없이 찾아 다시 세웠다. 훈민정음은 하늘·땅·사람이 함께 하는 소통의 만다라, 9층 목탑이었다. 이 땅에 훈민정음으로 온 역경불, 혜각존자. 신미는 ‘바른 소리〔正音〕’로 나그네를 떠나 주인으로 거듭나는 ‘해탈의 법문法文’ 훈민정음을 미래로 선물했다. 훈민정음은 세종과 신미가 마련한 ‘따뜻한 밥상’이었다.
새로 쓴 훈민정음의 역사
『훈민정음의 길 – 혜각존자 신미 평전』(814쪽)은 전 세계 문자의 우뚝한 봉우리인 소리문자 훈민정음(한글) 창제의 비밀과 교육, 확산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한 책이다. 집현전 학자 중심의 훈민정음 창제사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역사의 뒤편으로 밀려나고, 삭제된 훈민정음 창제의 핵심 인물인 혜각존자 신미스님의 적을 남김없이 찾아내 균형을 잡았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역사서, 15세기에 간행된 학자의 개인 문집, 훈민정음 연구서와 논문,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하고 검증해 낸 자료를 작은 부분도 빠뜨리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맞게 생생하게 풀어냈다. 1,374개의 주註는 실증적 자료 조사의 결과물이다.
훈민정음, 세종과 혜각존자 신미가 피워올린 우주의 꽃
지은이는 그 어느 역사서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훈민정음의 역사, 세종과 집현전 학자의 창제가 아니라 신미 스님이 훈민정음 창제에 깊이 관여했음을 사료를 통해 소상히 밝힌다.
신미의 행장行狀을 정리한 비문碑文도 남아 있지 않으나 흩어진 기록을 씨줄과 날줄로 엮어냈다.
『조선왕조실록』 속의 신미 관련 기사를 남기지 않고 확인했고 세종이 치열하게 훈육했던 집현전 학자들의 문집 속으로 넘나들어 숨은그림찾기를 해냈다.
“훈민정음은 신미가 쌓아올린 9층 목탑이다. 그러나 이 목탑은 살아남으려는 자들의 반대와 압박에 휘말려 흔적도 없이 잘리고, 뜯겨 나갔다. 상량문上樑文은 고사하고, 기둥 하나 남아 있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한다.
그리고 기어이 이 땅에 살아남은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문헌, 관련 논문과 연구서를 읽고 중요한 의미를 찾아냈다.
“훈민정음은 조선의 어둠을 밝히는 새벽별이었다. 수천년을 넘나들던 말과 생각과 사상의 물무늬를 한 곳으로 모아 또 다른 미래로 흘려보내는 발원수發願水였고, 감로수甘露水였다. 혜각존자와의 만남은 ‘항상 그곳에 있는 깨달은 이’의 가피였고, 장맛비와 같은 홍복弘福이었다. 신미는 훈민정음을 통해 중생의 고통 속으로 들어갔다. 불전 언해를 통한 훈민정음의 보급은 탁류를 거슬러 맑고 넓은 소통의 바다로 들게 하는 보살행이었다. 훈민정음은 세종과 신미, 수많은 선각자의 피와 땀이 어린 결과물이었다.”
『훈민정음의 길 – 혜각존자 신미 평전』은 지은이가 12년의 문헌조사와 사찰 순례를 통하여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훈민정음 창제의 핵심 편집인이었던 조선 초기의 고승 혜각존자 신미스님의 생애와 업적을 완벽하게 재구성한 결과물이다.
한편, 훈민정음을 국보 1호로 지정하자는 시민단체의 10만 서명 운동이 벌이고 있다. 해외에서는 뉴욕 뉴저지 한인 사회가 가장 적극적인 열기를 보이며 한글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문화유산인지 새삼 느끼게 했다. [코리아프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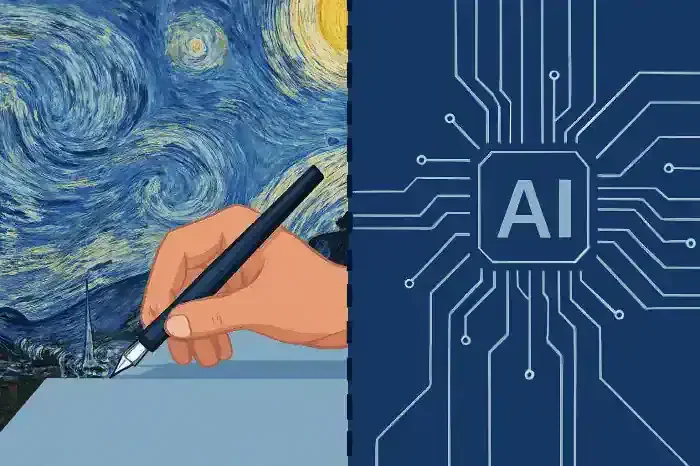
![[기획시리즈 | 한국사회와 노인] ② 창업이 아니라 추락이었다](https://media1.or.kr/wp-content/uploads/2025/06/A꾸미기85c7f0e2-cc2b-466a-b0f4-467a3300eb10-100x7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