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저널리스트들은 사회의 어두운 단면들을 보여주는 사실적 사진들이 관객의 도덕성을 일깨워 세계가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해왔다. 물론 그것은 상당 부분 사실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여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결정적 주체는 이데올로기이지 사진 그 자체는 아니다. 플로 마크는 정치적 메시지를 직접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는 포토저널리스트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회를 보여주기 위해 고민한다.
포토저널리스트들은 사회의 어두운 단면들을 보여주는 사실적 사진들이 관객의 도덕성을 일깨워 세계가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해왔다. 물론 그것은 상당 부분 사실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여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결정적 주체는 이데올로기이지 사진 그 자체는 아니다. 플로 마크는 정치적 메시지를 직접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는 포토저널리스트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회를 보여주기 위해 고민한다.
사진 아카이브 프로젝트 <위험 DANGER>(2014)과 영상프로젝트 <전이III Transition III>(2015)가 그것이다. 작가는 여느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져 보이지 않는 서울의 풍경들을 포착한다.
<위험 DANGER>은 작가가 지난 2년간 서울에 있는 노랑과 검정 줄무늬 선으로 만들어진 위험 표지판을 촬영한 것이다. 작가는 물리적 위험 상황을 강조하고자 고안된 이 표지판이 유독 서울에 지나치리만큼 많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페인트칠이 벗겨진 채 수없이 많은 곳에 놓여있는 위험 표지판의 사진들은, 세월호 사건을 비롯하여 한국의 2014년이 재난의 한 해였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한다. 작가는 수백 장의 사진 중 24장을 아코디언 책fan-folding book으로 제작했다. 아코디언 책은 작가가 이 전시를 위해 특별히 고안한 방법이다. 전체가 연결되어 있지만 페이지 마다 접힌 위험 표지판들은 사회적 위험도가 낱낱이 차단된 서울의 벽들로 상징하는 듯하다.
<전이III TransitionIII>는 퇴근 시간 반포대교를 교행하는 차들의 헤드라이트를 촬영한 영상 프로젝트다. 의도적으로 초점이 맞지 않게 제작된 이 영상은 영화에서 장면 전환을 위해 종종 쓰이는 변초점 장면전환de-focused transition 기법을 차용한 것이다. 도시의 불빛들을 몽롱하게 담은 영상은 사실에 관한 시선이 또렷한 <위험DANGER>의 클로즈업 이미지들과 대비를 이룬다. 저녁 러시아워의 다리를 달리는 몽롱한 불빛들은 도시인의 행동을 제어하는 엄격한 통제들이 이완되기 시작하는 ‘전이’의 순간을 상징한다.
작가는 자신의 사진이 전하는 서울의 풍경만이 사실이라거나 윤리적 혹은 정치적 지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주류 다큐멘터리적 사진이나 보도 사진의 미학을 의식적으로 해체하여, 자신이 보는 사실들이 사진 속에서 어떻게 포착되고 표현되는지를 고민할 뿐이다. 스스로 파편적이고 주관적임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작가의 태도는 사실적 사진이 가져야 하는 새로운 태도일지도 모른다. 사진의 물리적 존재감을 내려놓은 디지털 사진의 시대, 플로 마크가 전하는 서울의 풍경과 재현 방식에 우리는 주목해 볼 만하다.
코스모스팜 소셜댓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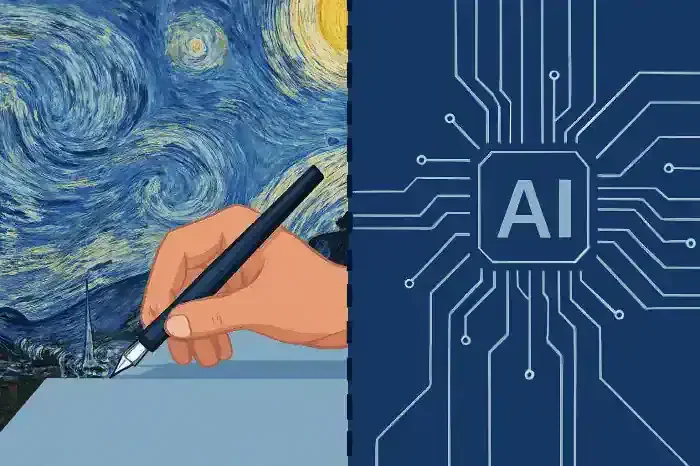
![[기획시리즈 | 한국사회와 노인] ② 창업이 아니라 추락이었다](https://media1.or.kr/wp-content/uploads/2025/06/A꾸미기85c7f0e2-cc2b-466a-b0f4-467a3300eb10-100x7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