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원=이정찬 기자)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어제의 모습이 오늘은 조금 더 변해가는 건 세상의 이치일 것이다. 한 여름 온 세상을 삼킬 듯 짙푸르던 나뭇잎은 어느새 그 기세를 접고 하루가 다르게 익어가고 있다.
이 모습을 퇴색되어 간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화려함으로 무르익어 간다고 해야 할까….. 그러나 분명한 건 기운차고 무성하던 여름날이 있었기에 단풍의 화려함도 뽐낼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이 있기 전 우리에겐 어떠한 모습의 것들이 존재했나 생각해 본다. 잊혀지고 희미해지는 것들을 찾아나서는 길, 예전의 골동품이나 민속촌 풍경이 아니라 우리의 핏줄 골골이 흐르는 뿌리를 찾아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
# 종손과 종부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대종가와 종택이 존재한다. 5천년의 역사 속에 성씨 하나쯤은 관직을 했을 일이고, 양반의 대열에 있었을 일이기에 후세인 모두가 스스로를 뿌리 깊은 양반의 자손임에 의심하지 않는다.
오늘날 역사의 한부분에서 양반이고 양인이었던 것이 뭐 그리 가름할 일인가, 수천년 수백년의 시간 동안 조상의 가르침대로 집안의 대소사를 치르고 가풍을 이어가며 종가를 지키는 이들이 있다. 점점 가파르게 퇴색되어가는 한국의 전통생활문화는 이제 종가를 지키는 종손과 종부들의 마지막 손끝에 남겨진 듯하다.
예술분야에선 명창의 노랫가락과 짚을 잇는 장인들의 재주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고자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또한 전국에 남아있는 옛 문헌이나 건축물들을 문화재로 지정 보존하여 관광산업에서는 그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힘들고 번거롭다고 버린 우리의 전통생활문화(유교문화)는 가문에 대한 긍지와 그 가문의 후손이 된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 도리(道理)를 외면하지 않는 종손과 종부들의 희생으로 가느다란 명맥만이 남아 있다.
사시사철 제례를 모시고, 제례 때마다 다른 음식들을 준비해 올리며 예복을 차려입는 등 집안의 대소사에 지켜야하는 법도들을 그들은 몸으로 익혀 지금까지 행하고 있다. 문헌이 아닌 살아있는 한국 전통생활문화재인 것이다.
누구도 쉽사리 이을 수 없는 옛 생활문화 전통을 우리는 과연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현재 종택을 지키며 살아가는 종부와 종손들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간다 해도 우리가 그들을 다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저 이들이 고집스레 지켜온 이 모든 것들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남겨질 수 있길 바랄 뿐이다.
# 화기리 인동장씨 종택

인동장씨는 본관이 같되 시조를 달리하는 장금용(張金用)계와 장계(張桂)가 있다. 장금용은 고려 초에 삼중대광(三重大匡) 신호위상장군(神號衛上將軍)을 지낸 인물이고, 장계는 고려말에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예문관대제학을 역임했다.
화기리 인동장씨 집성촌은 장계로 조선 세조 때 적개공신 경윤(景胤) 장말손(1431~1486)의 현손인 장언상(1529~1609)이 터를 잡고 살아오면서 후손이 번창하여 촌을 이룬 곳이다.
500여년의 시간을 지나온 인동장씨 종택은 건립 당시 옛 모습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 사랑채와 안채가 구조적으로는 이어져 있으나 독립된 평면 구성으로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왼편엔 사랑채와 안채가 위치해 있고, 오른쪽에는 유물각이 위치해 있다.
유물각을 지나 좀 더 들어가면 안채와 이어진 적개공신 장말손의 영정을 모셨던 영정각이 위치해 있다. 전체적인 종택의 구조는 굴도리의 소로수장집(접시받침으로 이루어진 집)으로 5량집 구성이다.

안채는 사랑채의 우측 중문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다. 대청 3칸과 좌측에 큰방과 부엌이 있고 우측엔 상방, 부엌, 고방 등의 기능으로 분할되어 ㅁ자 구조를 이루고 있다. 집안 곳곳엔 여전히 생활에 쓰여지고 있는 물건들로 채워져 종택은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었다.
안채와 분리되어 위치한 사당은 3칸에 간반통으로 앞퇴가 있는 맞배지붕 구조이다. 나지막한 흙 담이 사당을 둥글게 에워싸고 있고, 주변엔 수국과 백일홍 등 이름 모를 여러 종류의 꽃들로 소박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박물관이나 문화재로만 보존되지 않고 사람과 함께 숨을 틔우고 나이 들어가는 고택의 모습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빛이 더해 찾는 이의 가슴을 울리게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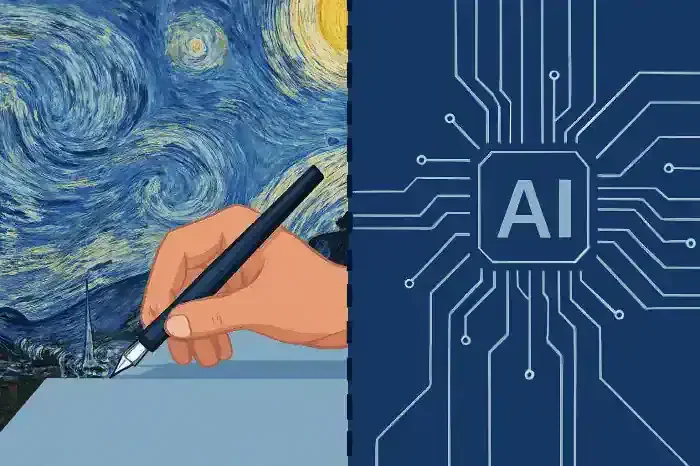
![[기획시리즈 | 한국사회와 노인] ② 창업이 아니라 추락이었다](https://media1.or.kr/wp-content/uploads/2025/06/A꾸미기85c7f0e2-cc2b-466a-b0f4-467a3300eb10-100x7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