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따스코를 처음 갔을 때가 12월쯤이었다. 한국은 한겨울이었으나 그곳은 그냥 봄 같았고 강우량도 적은 열대성 기후였다. 도시 초입부터 차는 계속 산 등을 돌면서 올라가 언덕을 넘자 도시 따스코(Taxco de Alarcón)가 보인다.
원래 이름은 따스꼬 엘 비에호(Taxco El Viejo), 즉 따스꼬 구도시란 말이다. 태평양을 끼고 있는 게레로(Guerrero)주에 속해 있다. 스페인 식민지 시절, 아스텍 문화가 꽃피우던 곳으로 은의 주산지다. 스페인에서 온 침략자들은 아스텍 인들이 많은 은으로 만든 장신구를 몸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것을 보고 우순 죽순 은광을 개발했다. 물론 아스텍 인들이 노예처럼 부려졌다. 그 당시 따스꼬에서 생산되는 은의 양은 전 세계 생산량에 큰 비중을 차지했다.
평균 날씨는 일 년 내내 섭씨 18~20도 정도로 선선해 살기 좋고, 고지대인 만큼 소나무, 참나무 등이 많아 공기도 맑다. 10월~5월 사이가 건기로 낙엽이 지는 걸 볼 수 있다. 건물들은 스페인 양식으로 건축됐고 그 영향으로 붉은 기와지붕이 많다. 멕시코의 명물 딱정벌레(VW) 택시 기사는 쉴 새 없이 떠들면서도 좁고 꾸불꾸불하고 급경사가 많은 길을 잘도 달린다. 도로는 검은 돌을 촘촘히 깔았고 벽은 흰 돌을 박아 개성이 넘친다. 인도는 아주 좁지만, 자동차나 사람들 다들 잘도 다닌다. 풍경화 같은 도로는 위험해 보이지만 아름다움도 동시에 품고 있다. 재미있는 건, 도로의 이정표다. 200년도 넘은 싼따 쁘리스까 성당(Santa Prisca Cathedral) 근처에 황소자리 그림이 보인다. 그쪽으로 가면 정육점이 있다는 말이다.
대부분의 특산품은 은 가공, 은세공, 은 제품 등 은은 따스꼬의 기반산업인 관광을 크게 떠받치고 있어 은과 은세공업자가 많다. 도시 외곽에 가장 큰 은광이 자리 잡고 있으나 지금은 은맥의 고갈과 고된 일을 견뎌내는 광부가 없어 스페인식민지 때부터 캐내 오던 은광 산업은 2007년쯤부터 휴업상태다. 영세하던 은 산업은 1920년대 윌리엄 스프레이팅이란 미국인이 이주해 디자인 공방 등을 열고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활기를 띠었다. 그리고 이때 관광산업도 같이 일어나 관광도시로 탈바꿈한다. 은 제품은 국내외로 소비된다. 5만여 명 주민의 반이 관광산업에 종사한다. 거리는 수백 개의 은공방과 은 가공용품점들로 가득하다.
따스꼬는 수도인 멕시코 시티(Mexico D. F.)에서 휴양도시 아까뿔꼬(Acapulco)로 가는 길에 있다. 멕시코 시티 버스터미널 아우또부세스 델 수르(Autobuses del Sur)에서 오전 9시~오후 8시까지 매시간 출발한다. 편도 2시간 30분 정도로 요금은 일 인당 200 Pesos(약 15,000원)로 싼 편은 아니다. 그러나, 버스에 화장실도 있고 에어컨과 TV에 음료수까지 제공하고 첫 버스는 간단한 샌드위치까지 준다. 중간중간 보이는 아름다운 산과 경치를 바라보면 어느새 따스꼬 시 버스터미널에 도착한다. 터미널에서 성당과 상점들이 즐비한 가장 번화가인 중심부 광장 쏘꼴로(Zocolo)까진 걸어갈 거리 정도, 택시나 버스로 가려면, “쏘깔로(Zocalo)!”라고 외치면 통한다. 따스꼬에서 출발해 멕시코 시티로 돌아오는 버스는 오전 5시~오후 8시까지 운행하며 가격과 소요시간은 같다.
솔직히 걸어서 둘러봐도 될만한 크기지만 급경사 오르막 내리막이 많으니 편한 신발이 좋다. 택시는 대부분 비틀이고 요금도 보통 20~30 Pesos(2,000원 안팎)이면 웬만한데 다 간다. 쏘깔로에 많은 저렴한 승합차 꼴렉티보(Collectivo)는 여럿이 타고 한 바퀴 둘러보기 좋은 교통수단이다. 1700년대 건축된 싼따 쁘리스까 성당이 도시 중심이다. ‘끄리스또(Cristo)라 불리는 예수 동상이 이정표 역할을 한다. 아름다운 건축물 까사 보르다(Casa Borda)는 은박물관이자 문화원 격이다. 2010년에 새롭게 단장해 더욱 많고 아름다운 은세공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산꼭대기에 있는 호텔인 몬떼 따스꼬는 텔레페이꼬(Teleferico)라 불리는 곤돌라를 타고 올라간다. 거기 식당과 바에선 따스꼬 도시 전체를 잘 내려다볼 수 있어 온종일 관광객들의 명소다.

온 김에 은 제품 구경 좀 하자! 진짜 감탄사가 나올 만큼 예쁜 제품이 많고 모든 제품엔 "MEXICO 925" 또는 "TAXCO 925"등 순은 보증 낙관이 새겨져 있어 품질을 보증한다. 또 그슬리고 새기고 두들긴 은(oxidized silver, textured silver, hammer silver ) 등 자세한 안내표도 있다. 도심 큰 상점을 벗어나면 가격도 흥정할 수 있고 도심지 상점보다 저렴하지만 오가는 시간이 꽤 된다. 도시 중심인 플라자 쎈뜨랄(Plaza Centrál)엔 많은 남녀노소 호객꾼들이 있다. 눈만 마주치면 바로 좌판을 열고 제품을 보여주며 흥정을 시작한다. 관심 없으면 그냥 눈길을 피해 외면하거나 오른 검지를 세워 들고 좌우로 두세 번 흔들면 바로 효과 있다.

멕시코 음식은 우리 입맛에도 딱 맞다. 어쩌면 오래전에 베링 해를 건너가 남쪽으로 내려간 우리 선조 쯤일 수도 있을 거다. ‘포졸레(Pozole)’를 기억해라. 말린 옥수수알갱이, 돼지껍질, 아보카도, 토르티야 부스러기 등을 섞어 끓인 수프다. 매주 목요일은 포졸레 날이라 빨강, 초록 수프를 먹어준다. 그 이외 요일엔 보통 흰색 수프가 제공된다. 그냥 현지인들이 가는 식당에 가면 가격도 적당하고 양도 푸짐하다. 덧붙여, 해장에 아주 그만이다. 시청 팔라치오(Palacio Municipal) 맞은편에 카페 치포틀레 데 발바스(Cafe Chipotle de Balbas)는 오후 6시~새벽 1시까지 영업하며 가벼운 샌드위치에서 풀코스까지 가격대가 60~90 Pesos(약 5,000~8,000원) 정도로 추천할 만하다. 특히 샐러드가 유명하다.


약 400년 된 호텔 까사 그란데(Hotel Casa Grande)가 주머니가 가벼운 여행자들에게 안성맞춤이다. 해 질 녘 옥상 테라스에서 따스코의 풍경을 보면 너무 황홀해 눈물이 맺힌다. 호텔 산따 프리스까(Hotel Santa Prisca)는 나무가 우거진 미니 정원에 조그만 분수도 있다. 야외 수영장이 있는 아구아 에스콘디다(Agua Escondida)는 광장 맞은편에 있어 편리하다. 약 400 Pesos(30,000원) 정도면 하룻밤 편안하게 묵을 수 있다. 대부분 WiFi가 무료다.
멕시코는 세계 10위의 관광국으로 관광업이 국내 3대 산업 중 하나다. 관광객 대부분은 가까운 미국인과 캐나다인이다. 관광자원도 풍부하고 날씨도 온화한데, 2014년 부패인식지수 35점으로 세계 103위, 2015년 언론자유지수 43.69로 180여 개 국가 중 148위다. 정부나 마약 갱단을 비판하는 언론인들이 대로에서 죽어 나간다. 정권이 부패하면 얼마나 나라가 망가지는지 보여주는 한 예다.

인천공항에서 직항은 없다. 가장 빠른 여정은 인천-샌프란시스코(약 11시간) – 멕시코 씨티(약 4시간반)으로 약 17시간, 또는 인천-나리타(약 2.20시간) – 멕시코 시티(약 13시간) 총 17시간 소요. 에어캐나다를 타고 벤쿠버-멕시코 시티 직항이면 미국 ESTA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왕복 약 170~220만 원 정도.

따스코에 얽힌 추억의 쎄뇨리따(Señorita)가 있다. 따스코 초입에 닭 구이 전문 2층 식당이 있다. 장작에 잘 구워진 닭을 또르띠야에 싸 먹으면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꽤 유명한 맛집이다. 동양인 그것도 남한(대한민국)이라니까 신기해하던 그 집 막내 딸내미가 눈에 띄게 귀여웠다. 나에게 다음에 또 오면 뭐든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고 장난삼아 약속하기에 출장거리 만들어 또 갔었다. 2주 만에 다시온 나를 보고 반색하며 약속을 지키겠다기에 둘이 손잡고 불 꺼진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녀 오빠가 따라 올라와서 결국 아쉽게도그녀는 약속을 못 지켰다.

Photo Credit | Machobat, On Topic Me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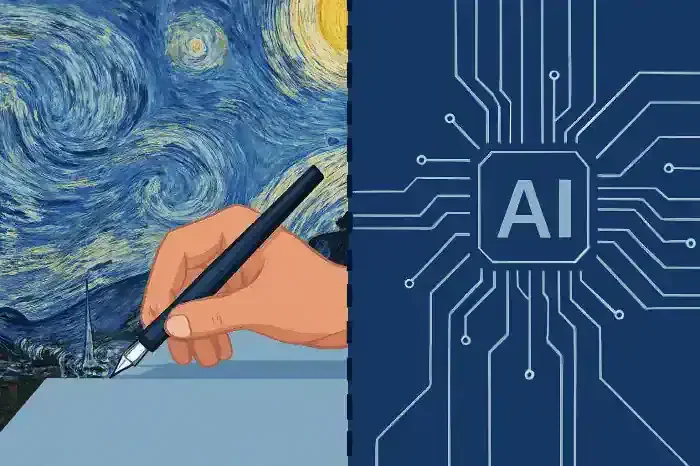
![[기획시리즈 | 한국사회와 노인] ② 창업이 아니라 추락이었다](https://media1.or.kr/wp-content/uploads/2025/06/A꾸미기85c7f0e2-cc2b-466a-b0f4-467a3300eb10-100x7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