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박철민 작가) 16C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의 주위를 행성과 지구가 돌고 있다는 그 유명한 ‘지동설’로 발상의 전환을 얻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중요한 것은 르네상스와 신성 본질주의자들의 로마교황청의 독재에 대한 반발 이후, 과학이 주는 이성적인 영역을 신과 창조 사이에 끼워 넣었다는 것입니다.
‘사유 왕국의 위대한 파괴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철학자 임마뉴엘 칸트는, 합리론과 경험론을 아우르는 새 사조를 완성함으로서 발상을 전환시킨 최고의 철학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철학자인 그의 이성에게도, 데카르트에 의해 한번은 순화되어졌지만, 神의 권위는 여전히 막강했나 봅니다. 유쾌한 농담에 풍부한 유머를 썩어 지성과 진리를 설파했던 순수이성비판과 실천이성비판, 그리고 판단력 비판의 ‘3대 비판서’를 내며, 인간의 인식혁명으로 합리론과 경험론을 주창했던 가정교사 출신의 대 철학자도 넘지 못한 선인 신의 영역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철학자인 자신이 경험한 세계와 인간 의식의 문제와 자유, 그리고 불멸의 사유로 고뇌하며 신을 추방했던 이 위대한 지성(知性)도, 결국은 다시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었다는 도덕덕인 선험론으로 완성된 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 철학자가 머리 숙인 진정한 ‘신’의 모습은 혹연 프로이드의 의료심리학이나 스티븐 호킹의 물리학적 뇌 구조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아둔한 필자는 알 수 없습니다.
19C에 헤겔의 영향을 받은 루트비히 바이어바흐가 ‘신과 절대자는 나약한 인간이 만들어 낸 허상에 불과하다’는 발언을 해서 교황청을 격분시켰지요. ‘종교는 나약한 인간이 만든 허상’이라는 주장도, 천국 마케팅과 극락장사, 그리고 조상마케팅의 근원은 모든 돈이라는 명제도 타당합니다. 한편으로는 나약한 인간 대신 인간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 누구도 섣불리 범접하지 못하며 이 푸른 행성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절대자인 ‘신’의 존재 앞에 인간은 사실 유약합니다.
그랬을 겁니다. 현재도 이런데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믿을 것인가로 고민하던 칸트를 위시한 시대의 거대한 산과 같았던 대 철학자들에게도, 당연히 ‘신’은 정녕 넘을 수 없는 벽(넘사벽)이었는지 모릅니다. 짜라투스트라(조로아스터)를 통해 초인을 내세운 니체도, 변증법과 유물론으로 실존의 영토를 개척한 헤겔과 같은 괴짜 철학자들에게도, ‘신’은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존재는 감각이 아닌 숙고를 통하여 성숙 한다’고 고대 엘레아 철학자이자 ‘존재론자’인 파르메니데스는 말했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했던 시절에는 종교 대신 이성을 매개로 한 존재와 사유가 생각하는 힘 안에 내재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에 충만한 존재는 불변의 원칙을 만들어 내는 질료라는 것이었지요. 스티븐 호킹의 삶을 그린 영화 ‘사랑에 관한 모든 것’에서의 사랑은 한 위대한 과학자의 생애에만 초점을 맞춘 사랑이 아니라, 아내를 포함한 주변인들과의 아슬아슬한 관계, 스스로의 욕망(성적인 욕망을 포함하여), 그리고 존재가 성숙하는 관점이 숙고(熟考)에 있다는 명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물론 파르메니데스가 깨달음을 얻은 그 당시 철학계에는 그의 존재론적 불변부동의 원리를 부정하는 대척점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파르메니데스와는 달리 원칙은 불변한 것이 아니라 때때로 변화하는 진폭을 가진다고 했다하지요. 이렇듯 변하지 않는 것과 변화하는 것 사이의 닿을 수 없는 물리적인 거리는, 마치 서로 다른 인간들이 내면적으로 느끼는 타인들과의 괴리감처럼 진한 녹조현상을 일으킵니다. 마치 인간 감정의 미묘한 화음은 그 진동이 수밀도(水蜜桃)와 같아 포근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깊어 어느 리듬에 춤을 춰야 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라는 화두’는 종교의 영역인 창조설과 과학의 영역인 진화설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아직도 명쾌한 해석을 유보한 채 서성거리는 두 영역의 자리다툼에서, 존재의 의미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사는 인간관계의 그늘을 만들며 일상의 자잘한 통증을 잊는 것도 사는 방법 중의 하나겠지요. 사실은 그 영역 안에서 자생하며 잠자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른 것이니 넉넉하게 인정하며 그냥 삽니다. 앞에서 열거한 석학들의 비전은 세계의 정신을 덮지만, 적막하고 고요한 일상을 사는 자에게 침윤(浸潤)할 뚜렷한 사상이나 이상은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불면의 고통을 뒤척이게 하는 추위가 부쩍 잦아드는 새벽, 미처 잘 알지도 못하는 철학으로 씨름해야 하는 서민의 바람은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으면 하는 신념입니다. 덧붙여 밝아오는 미명의 아침에는 분명 성량 풍부한 새들의 지저귐과 더불어 상상력을 동반한 비전의 철학이 낮은 목소리로나마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물론 그 새들의 맑은 영혼의 소리에는 창조와 진화의 숨결이 어느 한 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묻어 있을 테지요. 사실 그런 변화를 기대하지만 또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새벽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하루 또한 내 삶의 일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글: 박철민/칼럼니스트 작가
사진: 픽사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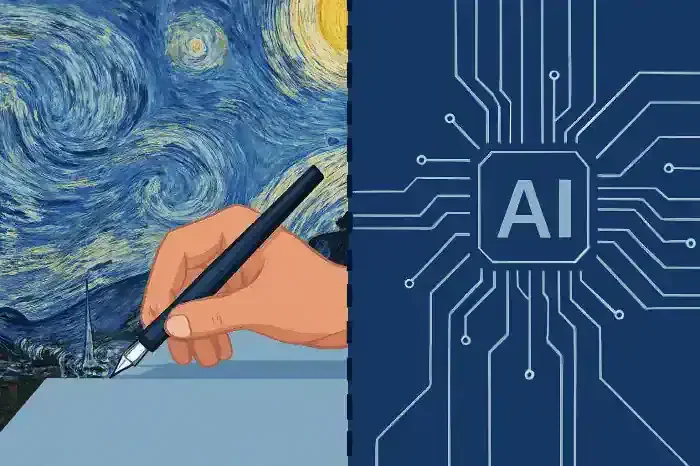
![[기획시리즈 | 한국사회와 노인] ② 창업이 아니라 추락이었다](https://media1.or.kr/wp-content/uploads/2025/06/A꾸미기85c7f0e2-cc2b-466a-b0f4-467a3300eb10-100x7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