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하를 처음 접한 것은 대학시절 배낭여행으로 그 곳을 다녀왔다는 예전 동료기자의 글 그리고 그 녀석이 손수 찍었다고 자랑하던 유명한 볼바타 강의 다리, 카를교의 사진에서였다.
그 기사를 별 감흥 없이 읽어내려 간 것은 ‘풀빵구리 제 집 드나들’ 듯 다녔던 유럽의 세계적인 도시와 유적들에 견주어 별 것 없다는 선입관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 다리가 아름답긴 하네…….’ 그 정도였을 뿐이다.
몇 주 지나지 않아 다시 한 번 프라하 기사를 만났다.
이번에는 체코인들의 자부심이라는 ‘필스너 우르켈’을 비롯한 체코 맥주 이야기 속의 프라하였다.
프라하는 카를교와 필스너 우르켈로 슬며시 내 뇌리 속에 자리 잡은 것이 분명했지만 애써 가보고 싶은 곳이 아니었던 것은 사실이다.

세계적인 항공사로 명성을 높이고 있는 터키항공의 갑작스런 여행 제안 속에 들어 있던 프라하와 필젠, ‘흠 이제 카를교를 걷고 필스너 맥주를 마셔보겠군, 나쁘지 않아. “라고 짐짓 대수롭지 않은 척 했지만 급히 여행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체코로 향하고 있었다.
사실 내게 체코는 30대 친구들이 그려보는 ‘연인의 도시, 맥주의 도시’가 아니라 ‘자유의 도시’였다. 2차 대전 후의 동서냉전 시대에 구소련의 막강한 위성국이었던 체코슬로바키아는 오늘날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며 소국으로 바뀌었지만 당시의 위세는 결코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의 동맹인 ‘바르샤바 조약기구’에서의 위세보다 체코인들의 자유를 향한 열망은 더욱 크고 강렬했다. 1968년 스탈린식 공산주의에 항거하여 일어난 ‘프라하의 봄’의 저항정신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있다.
피를 흩뿌리며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던 선인들의 의지는 오늘 체코를 ‘자유로 충만한 나라’로 만들었을 것이다. 물론 동남유럽 국가에 비해 월등하게 앞선 공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덕택이기도 하였겠지만 체코인들의 지혜로움과 근면함이 오늘 중부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의 하나로 손꼽히게 된 이유일 것이다.

카를교를 지나 프라하의 구시가로 들어가는 밤은 특별하다. 낮은 조명 덕으로 적당한 어둠을 품고 있는 카를교에서는 파리 광장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바쁜 몸짓으로 사진을 찍고 가이드의 안내를 들으며 쉴 새 없이 지나간다. 유럽 3대 야경 중 하나라는 명성처럼 카를교 아래를 흐르는 밤빛 내려앉은 볼타바강의 물결은 황금빛 옷을 입고 찬란한 모습으로 늘어서 있는 강안의 웅장한 중세 건물들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고 있다.
달빛 바스락 거리는 볼타바 강물 위 희미한 안개등 불빛 아래를 홀로 걸으며 낭만에 젖겠다는 생각은 예전 그 녀석의 사진에서 얻은 영감에서 비롯되었었다. 그 꿈은 사라졌지만 온갖 나라에서 온 젊음 가득한 남녀노소와 한 무리로 다리를 밀려 지나가는 것이 불만스럽지도 덜 낭만스럽지도 않다.

굳이 지도를 펼치고 램프를 찾지 않아도 된다. 무리들이 걷기 시작하면 함께 걷고 그들이 사진을 담을 때는 역시 그리 하면 된다.
다리를 건너고 나면 주위에 여백이 생긴다. 오랜 옛 도시의 포도 위를 걷는 느낌이 새삼스럽게 느껴지고 그 바닥돌들이 지나왔을 인고의 시간과 프라하의 역사를 잠시 생각한다.
작은 도시를 메운 사람들의 행렬로 고도의 작은 행길을 오가는 자동차가 생경하게 느껴진다.
‘프라하의 구시가엔 자동차가 아닌 마차가 다녀야 맞는 것이야,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걸어!’
구시가에서 내 시선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것은 밝은 금빛 옷으로 치장한 ‘틴 성당’과 주변의 아름다운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양식의 건물들인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슬쩍슬쩍 눈이 닿은 곳은 프라하의 멋을 팔고 있는 작은 수공품 가게들 그리고 멋스러움을 담은 노천카페들이다.
한 잔의 와인과 향내 짙은 커피 사이의 갈등은 필젠 맥주로 잠재워 버리고다시 젊은 자유로 가득한 밤으로 빠져 들어간다.
68년의 ‘프라하의 봄’은 25년의 긴 겨울을 지나 1993년 시작되었고 체코와 그 수도 프라하는유럽에서도 가장 자유가 넘치는 나라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곳 프라하에서 나는 평화와 자유의 오늘과 번영과 발전의 내일을 보았다.
글 사진: 이정찬 기자/미디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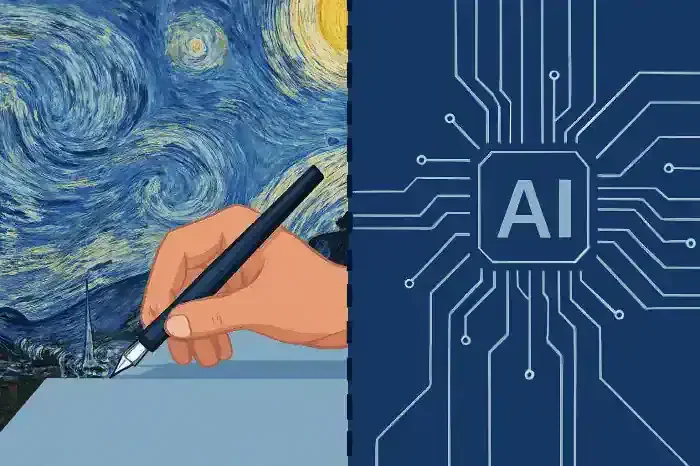
![[기획시리즈 | 한국사회와 노인] ② 창업이 아니라 추락이었다](https://media1.or.kr/wp-content/uploads/2025/06/A꾸미기85c7f0e2-cc2b-466a-b0f4-467a3300eb10-100x7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