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마이스=이정찬 기자) 지난 주 먹었던 국수가 소화도 되기 전, 다른 국수의 유혹이 시작됐다. 이번에는 거리도 만만찮은 안동의 국시! 기름값은 이미 국수 값을 넘어섰을 뿐이고, 얇아지는 지갑에도 떠날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맛의 대한 열망 하나다. 선비의 고장에서 맛보는 안동국시, 떠나보세나!
안동? 국가대표 선비 마을!
‘국수’의 어원을 옛 문헌에서 찾아보면, ‘밀가루로 국수를 만든다. 밀가루로 밀기울도 만든다. 우리나라에서 국수는 주로 메밀가루로 만든다. 그런데 메밀가루는 술을 내면 맛이 없다. 그러므로 밀기울로서는 메밀가루가 원수이니, 메밀가루 국수는 밀기울의 원수, 곧 국수라 한 것이다’ 라고 전한다. 잘 알아들을 수나 있을까? 친절한 더 마이스 신문은 독자에게 비유적인 설명도 곁들여준다.
우리나라에서 국수의 재료를 놓고 밀가루와 메밀가루가 있었는데, 밀가루가 부족해 메밀가루가 대종을 이루었다. 밀가루의 아들뻘인 밀기울이 아버지 밀가루를 밀어낸 메밀가루를 원수로 여긴 다 해서 ‘국수’ 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이 된다. 억지 끼워 맞추기라고 할지는 몰라도 설득력 있지 아니한가? 이렇게 나온 국수라는 말의 방언이 ‘국시’ 다. 혹자는 국수와 국시의 차이점을 “밀가루로 만든 것이 국수요, 밀가리로 맹그른 것이다” 라고 하지만, 웃자고 하는 얘기지 않겠는가?
안동은 국가대표급 선비들이 태어난 유서 깊은 고장이다. 전통의 보전도 잘 되어있는데, 하회마을은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 될 만큼 유명한 곳이다. 안동하회마을 풍산류씨가 600여 년간 대대로 살아온 동성마을이며, 기와집과 초가집이 잘 보존 된 곳이다. 조선시대 대 유학자인 겸암 류운룡과 임진왜란 때 영의정을 지낸 서애 류성룡 형제가 태어난 곳으로도 유명하다.

하회마을에는 서민들이 놀았던 ‘하회별신굿탈놀이’와 선비들의 풍류놀이였던 ‘선유줄불놀이’가 현재까지도 전승되고 있고, 전통생활문화와 건축양식을 잘 보여주는 문화유산들이 보존되어 있다. 지난 1999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다녀가기도 했다. 이날, 조옥화 여사가 직접 생일상을 차렸는데 47가지의 이르는 음식으로 상다리가 휠 정도였고, 여왕은 원더풀, 뷰티풀을 연발했다는 후문이다. 여왕 방문을 축하하는 기념관도 세우고 식수도 있으니 구경을 하는 것도 좋겠다.
안동 시내에서 1시간 거리에는 도산서원이 있다.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1574년 지어진 서원으로, 도산면 토계리에 위치하고 있다. 건축물들은 전체적으로 검소하게 꾸며졌으며, 선비의 자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크게 도산서당과 이를 아우르는 도산서원으로 구분되는데, 서당은 선생이 몸소 거처하며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이고, 서원은 퇴계 사후 건립 사당과 서원이다.

도산서당은 1561년에 설립되었다. 퇴계선생이 낙향 후 후진양성을 위해 지었으며, 서원 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퇴계선생이 직접 설계했다고 한다. 유생들의 기숙사 역할을 한 농운정사와 부전교당속시설인 하고직사도 함께 지어졌다. 도산서원은 퇴계선생 사후 6년 뒤인 1576년에 완공되었다. 1570년 퇴계 선생이 돌아가시자 1572년에 선생의 위패를 상덕사에 모실 것을 결정했다. 2년 뒤 지방 유림의 공의로 사당을 지어 위패를 봉안하였고, 전교당과 동·서재를 지어 서원으로 완성했다. 1575년, 한석봉이 쓴 편액을 하사 받음으로써, 사액서원으로 영남유학의 본산이 됐다.
이젠, 정말 국수 먹으러 간다!
서원을 돌고나면 점심시간은 이미 한참 지났다. 주린 배를 움켜쥐고, 맛집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워 정신마저 아득하다. 건진국수와 누름국시는 안동의 맛이 곳곳에 배어있다. 콩가루와 밀가루를 섞어 국수를 반죽하는데, 여름철 음식이라 면이 금방 끈적해진다. 한 여름 연신 콩가루와 밀가루를 뿌리며 면을 반죽하는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제분기술이 지금 같지 않을 때, 안동국수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서 밀가루를 선별했다.
병풍을 펴고 절구에 빻은 밀가루를 부채질 한다. 앞의 한지에는 고운 가루만 쌓이는데, 이것을 이용해 반죽을 한다. 맛은 둘째치더라도, 그 정성이 어떠한가? 아쉬운 점은 현재 밀가루의 질이 높아져 완전히 전통방식으로 면을 뽑아내는 곳은 없다는 점이다.
보통 국수를 떠올리면 서민의 애환이 담긴 음식이란 생각을 한다. 과연 안동국수도 그럴까? 안동 지방에는 특이한 풍습이 있는데, 제사상에 국수가 올라간다는 점이다. 워낙 조상님이 국수를 좋아하셔서 올린 것인지 그 유래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다. 제사상은 정성이 담긴 음식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안동에서 ‘국시’를 만들 때는 콩가루와 밀가루를 섞어서 만든다. 콩가루는 무엇인가? 뜨거운 물에 닿으면 비린내가 난다. 원래 반죽은 뜨거운 물에 해야 찰기가 좋지만, 콩가루란 녀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가운 물로 해야 한다. 반죽이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가 된다. 콩가루가 섞인 국수는 밀가루 국수의 2~3배는 더 반죽해야 비슷한 찰기가 나오며, 콩 특유의 퍽퍽함 때문에 큰 홍두깨가 아니면 밀리지도 않는다. 안동 국시를 만드는 노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밀리지 않는 반죽을 최대한 얇게 밀어야 한다. 메밀국수의 툭툭 끊어지는 치감과 밀가루 국수의 쫀득함, 그 중간 어디쯤에서 균형을 잡는다.
면을 삶을 때도 신경을 써야한다. 면이 엉키지 않도록 잘 저어 줘야 하는데, 안동국시 면발은 끈기가 약해 쉽게 끊어져 버린다. 비결은, 큰 솥에 물을 가득 담고 아주 살살 저어주는 수밖에 없다. 이런 인고의 시간 속, 종부의 손끝에서 국시의 면발이 탄생한다. 육수를 만드는 것도 특이한데, 작은 생선이나 치어를 사용한다. 살아있는 물고기로 육수를 우리면 필연적으로 비린 맛이 나기 마련, 은어나 멸치 등의 포를 사용한다.
이 국물 맛이 절대적인데, 서울에서는 맛 볼 수 없는 극적인 담백함과 구수함을 느낄 수 있다. 고명 또한 형식을 지켜 올린다. 계란 등의 고명은 마름모꼴 이어야 하며, 면을 썰 때 칼을 댔으니 고기 고명에는 칼을 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진 국수의 경우는 국수를 따로 삶아 찬물에서 건져내, 건진 국수라고 한다. 육수와 면을 따로 조리하며, 찬물에 행궈진 면발은 통통함의 최고조에 다다른다. 노르스름한 면발과 맑은 육수는 대가집 선비의 절개를 보여주는 듯 기품이 있다. 퍽퍽함과 쫄깃함의 어귀를 느낄 즈음, 밀려오는 육수의 담백함! 옳거니, 이것이 안동의 맛이로구나.

‘후룩후룩’ 한 대접을 비우고 곧 누른 국수가 나왔다. 체면을 지킬 여유는 이미 버린지 오래다. 걸신과 접신한 기자는 누름국수도 먹기 시작했다. 누름국수의 다른 이름은 제물국수다. 이 말은 국수를 삶을 국물을 갈지 않고 그대로 먹는다는 의미를 뜻한다. 건진국수가 맑고 담백해 여름에 먹는 국수라면, 누름국수는 겨울에 먹는 별미, 건진국수가 양반의 국수라면, 누름국수는 서민의 음식이다. 콩가루가 들어간 반죽을 얇게 밀어 칼로 써는 것은 같지만, 이 면은 폭을 조금 두껍게 썬다. 또, 직접 장국에 넣고 끓여내 걸쭉한 국물의 풍미가 가히 세계제일이다. 누름국수는 일반적인 칼국수와 비슷한 느낌이지만, 건진국수와 누름국수 모두 고소한 콩의 향이 은은하게 퍼진다.
누군가 맛의 폭죽이란 표현을 했지만, 두 국수는 맛의 강이다. 특별히 자극적인 맛도 아닌, 맵거나 짜지도 않지만 깊은 맛과 콩가루의 향은 도도하게 식도를 흘러 은어의 고향인 강으로 위장을 인도한다.
짧은 기간의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국수가 있어서 기자는 행복했다. 세상의 사는 재미가 무엇인가, 50%는 먹는 즐거움이다. 또, 국수는 서민과 양반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긴 대표적인 음식이니 내용만은 굵었던 안동 여행이었다.
다음 국수 기행을 기대하며 서울로 오는 길목에서도 생각나는 안동국시 한 대접,
“오늘 밀가리랑 콩가리로 맹근 국시 한 대지비 잡수실랍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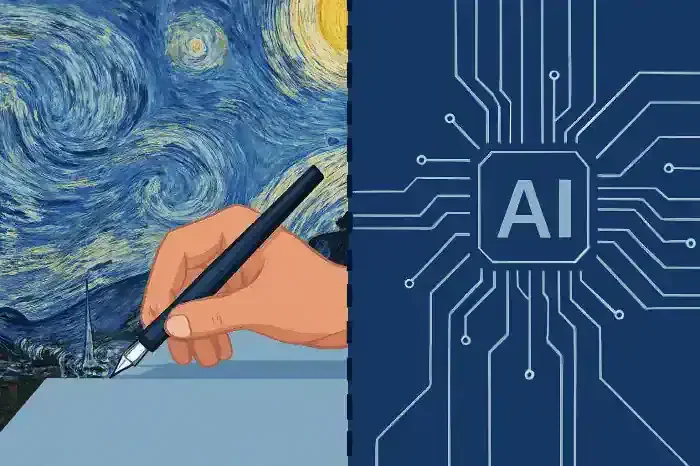
![[기획시리즈 | 한국사회와 노인] ② 창업이 아니라 추락이었다](https://media1.or.kr/wp-content/uploads/2025/06/A꾸미기85c7f0e2-cc2b-466a-b0f4-467a3300eb10-100x7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