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이 동진기자)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간판기업이 한·일 경제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했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과 지나친 시장 개입, 먼지털기식 압박에 대한 대비책이다.
경제전쟁의 최전선에 선 기업 사이에선 일본과 싸워 이기려면 ‘족쇄’부터 푸는 쪽으로 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에 가장 먼저 내민 ‘청구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이었다. ‘재벌개혁’ ‘부자증세’ 등의 대선공약 이행과 재정 확보를 위해 꺼내든 카드다. 당시 기업들은 증세 자체보다 논의 과정에 불만이 컸다. 증세의 당위성을 둘러싼 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었던 탓이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정작 돈을 내야 할 당사자(기업)한테는 한마디 의견도 묻지 않았다”며 “높은 법인세율을 피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일이 늘어나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탈(脫)원전’도 대표적 일방통행 정책으로 꼽힌다.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일감이 줄면서 한때 ‘한국 제조업의 메카’로 불리던 경남 창원의 기계, 중공업 공장은 초토화됐다.
올 초 문재인 대통령과 국내 기업인 간담회에서 “원전기업이 무너지면 한국 원전산업 생태계는 복원하기 힘든 상태에 이를 것”(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이란 하소연까지 나왔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개별 기업 및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원칙) 행사가 대표적 사례다. 올 들어 기관과 주주들이 잇따라 경영 개입에 나서면서 기업과의 갈등이 커지는 추세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압박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자영업자를 돕겠다며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낮추라고 압박하자 카드사는 손실 보전을 위해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을 추진해 갈등을 빚었다. 시장의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정부가 들고나온 협력이익공유제는 과도한 수준을 넘어 ‘황당한’ 경영 개입 사례로 지목된다. 대기업의 이익 일부를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제도를 법제화한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발상이라는 게 기업들의 반응이다. 한 경제단체 임원은 “대기업에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로 나가 돈을 벌라는 ‘신호’로 비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업엔 국회도 공포의 대상이다. 재벌개혁을 내세워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법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낼 가능성이 커서다. 기업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가 총선을 앞두고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올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뼈대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국내 주요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에 노출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지주회사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도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 대기업 전략기획담당 임원은 “사업에만 신경 써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맨날 ‘그림(지배구조)’만 그리다 날 샐 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정당국의 매서운 ‘칼끝’도 기업을 옴짝달싹 못 하게 묶고 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4대 사정기관에 의해 한 번이라도 조사받지 않은 대기업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최근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관세청 등도 기업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가세하고 있다.
기업인들은 입을 닫았다. “괜히 입바른 말을 꺼냈다가 찍히면 검찰이나 국세청에 탈탈 털리지 않겠느냐”는 걱정 탓이다. 한 중견기업 대표는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공격적으로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투자를 늘릴 수 있겠느냐”며 “정부의 파격적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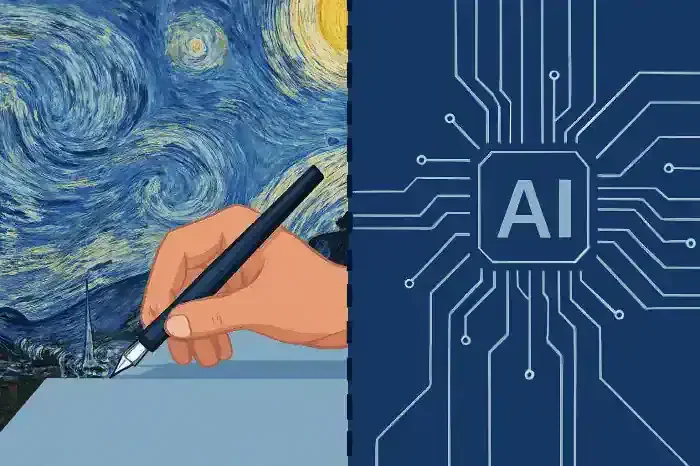
![[기획시리즈 | 한국사회와 노인] ② 창업이 아니라 추락이었다](https://media1.or.kr/wp-content/uploads/2025/06/A꾸미기85c7f0e2-cc2b-466a-b0f4-467a3300eb10-100x7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