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김홍덕 기자) 연간 1,000개가 넘는 축제의 나라 대한민국. 계절의 변화 때마다 일어나는 축제에 그 지방 토속적인 음식을 주제로 벌어지는 축제들. 그러나 어딜 가나 연예인의 노래 무대, 먹거리 장터, 어린이 대상 체험거리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벌어지는데도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저마다 ‘글로벌’이니 ‘국제’니 하는명칭을 붙인다.
한 연구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고유의 컨텐트를 가진 진짜 축제 성격의 행사들은 불과 20여 개 뿐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러한 축제 열풍은 최근 지자체들 사이에 올레길, 둘레길을 지나 각종 ‘길만들기’로 이어져 경쟁적으로 과다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 또한 적지 않다.
구태여 이런 걸 왜 새로 작명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구간이 짧거나 특색이 없는 길들이 많은가 하면 겨우 이런 길을 내려고 데크를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또한 사실.
최근에는 지자체별로 청년 일자리 지원금이라는 묘한 정치적 사회 복지프로그램이 나오더니 이젠 무슨 연방제의 나라도 아닌 작은 공화국에서 지방마다 자체적으로 화폐를 만들어 새로운 경쟁을 시작했다.
이 모든 흐름들의 공통점은 외부로부터의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민들의 소비와 경제를 촉진함으로써 그 지방의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런데 모방과 창조, 경쟁의 패러다임이 가득찬 대한민국의 새로와진 면모는 급기야 4차 산업을 지나 6차 산업으로 들어온 형국이어서 이제 관광 분야에서도 십 여 년 전에 시작된 의료관광을 넘어 드디어 MICE의 확산으로까지 이어지기에 이르렀다.
일산 킨텍스의 성공적인 전시 산업이 – 사실 대규모 혹은 진짜 글로벌한 전시회는 여전이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지만 – 급기야는 MICE의 타 분야로까지 확대되면서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이 눈물겨운 형국이다.
MICE를 유치 혹은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매머드급 호텔의 부족이라든가 행사 전문 인력들의 저임금으로 인한 이탈 현상들을 어찌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 또한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MICE 산업의 높은 부가가치를 생각한다면 컨벤션 뷰로 구성 혹은 컨벤션 센터의 신규 건립 등이 필수적인 일이겠지만 이러한 하드웨어 못지 않게 인력 지원 및 양성 뿐 아니라 실제로 가동 가능한 이벤트의 컨텐트와 질 등 이른 바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의 통합 작업 또한 미리 준비해야 할 사안이 아닐까 싶다.
특히 이미 지방에서도 운영중인 관광공사들이 MICE 분야 진작을 위해 내놓는 프로모션 카드들 중에는 MICE 대상 기업 및 해당 기관들까지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육성, 확대될 컨텐트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알리며 해외로부터의 이벤트/업체 유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홍보, 마케팅, 컨설팅 작업 또한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대행할 외부의 전문 기관에 아웃소싱하는 문화가 없는 우리나라는 싱가폴, 홍콩 등 아시아의 영어권 경쟁국들이 갖는 언어적, 지정학적 우위뿐 아니라 다양한 경험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컨텐트 및 서비스 개발이 당연히 뒤쳐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한류, K Pop, 김치, 올림픽 등 반짝 혹은 지나쳐 흘러가는 일시적인 언론 주목 현상에 편승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른 바 ‘모든 산업의 꽃’인 MICE이기 때문이다.
사진: 내나라 여행박람회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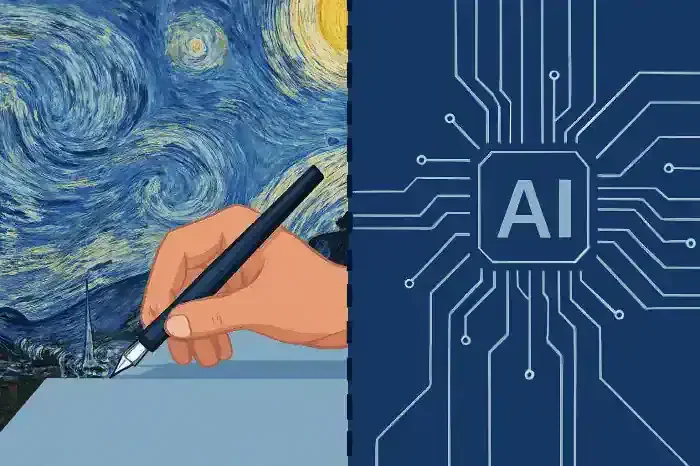
![[기획시리즈 | 한국사회와 노인] ② 창업이 아니라 추락이었다](https://media1.or.kr/wp-content/uploads/2025/06/A꾸미기85c7f0e2-cc2b-466a-b0f4-467a3300eb10-100x7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