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이 되고 싶은가? 바위산의 암자로 태어나고 싶은가?
프롤로그
아득한 옛날, 세상 만물이 굽어보이는 경치가 기가 막힌 산정(山頂) 바위에 앉아 놀던 신선(神仙)들이 세월 가는 줄 모르고 투전판(?)을 벌이다가, 그만 근무이탈제로 옥황상제에게 파문을 당한 곳이 신선대(神仙臺:726m)라고 우긴다면 믿어주실는지요. 그리 맑지 않은 날 등정한 관계로 신선대를 지척에 두고 있는 최고봉(740m)인 자운봉(紫雲峯)과 만장봉(萬丈峯:718m), 선인봉(仙人峯:708m) 삼형제 봉우리조차도 제대로 조망하지 못할 정도였고, 심하고 강한 바람이 옷깃을 물어뜯어 30분 이상 쇠기둥에 매달려 담을 수 있었던 신선대 정상의 촬영사진도 행여 휴대폰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을까 저어하여 다시 쇠기둥을 타고 재빨리 내려오는 곡예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화강암 암벽의 바위인 암벽등반의 명소인 높이 50m 둘레 20m의 선인봉과 기암절벽 수직으로 둘러싸인 자운봉, 만장봉 곁에서 다정하게 미소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높이 60m의 수직 암봉으로 역시 암벽등반의 메카인 주봉(柱峰:해발675m)에 올라 바라본 삼형제 봉우리는 금슬 좋은 부부였지요. 신선대는 곁에서 만개한 꽃봉우리처럼 활기에 넘쳐 보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사패산과 만장봉 오봉 우이암을 아우르는 길이 11km, 7개의 능선(산등성이: 포대능선, 사패능선, 도봉주능선, 오봉능선, 다락능선, 우이남능선, 보문능선)을 따라 형성된 봉우리들은, 각자 독립적인 산으로 작용하며 도봉산의 위용을 체계적으로 받쳐주는 수도권의 소중한 젖줄이었던 것입니다.
 올라가는 길은 언제나 힘들지만 오를 곳이 있어 즐겁다.
올라가는 길은 언제나 힘들지만 오를 곳이 있어 즐겁다.
도봉산역에 내리기 전 잠시 시를 생각했던가요? 아니면 등산로 초입에 있는 시인 김수영의 시비(詩碑)를 생각하며 생활을 위해 그가 키웠던 닭과 시에 침까지 뱉어가며 현실세계의 모순(矛盾)을 극복하려 한 참여시인의 눈동자를 생각했던가요? 둘레길의 이정표가 선명한 역사를 나오자 여전히 붐비는 도봉산 등산로는 이제 아주 돛대기 시장이 되어있었습니다. 역사에서 등산로 초입, 도봉탐방지원센터가 위치한 1km 남짓한 길은 그야말로 혼잡한 여느 재래시장을 방불한 것이 밤이면 불야성을 이루는 환락가가 되는 곳이니까요. 서울에서 도봉산만한 등산로가 없으니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산의 정신을 만나러 오는 등산객에게는 바람직한 모습은 정녕 아니지요.
이태 전인가? ‘북한산둘레길’을 완주했을 때 비교적 한적하던 도봉산 입구는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말인 탓도 있을 것이고 단풍철의 끝자락을 놓치기 싫은 마음이 코로나로 막혀 있던 자연에의 향수를 자극한 측면도 강했을 겁니다. 다행이랄까요. 복잡한 입구를 벗어나니 전에는 보지 못한 시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넓디넓은 공간에 만들어놓은 <도봉산 수변무대 태양광 쉼터>. 이 정권의 핵심사업인 태양광 사업의 귀결물이 아니라면 코로나 한파가 저물 즈음에는 이 훌륭한 야외무대를 수놓을 문화예술인들의 활약과 문화예술에 젖은 등산객과 주민들의 흐뭇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잠시 서서 그 광경을 그려봅니다. 더불어 등산로 초입까지 이어진 길에 비교적 선명한 단풍의 행렬을 감상하며 걷는 미덕도 달콤한 경험이었지요.
 오백 여 년 전 이 길을 걸어 관음암(觀音庵)으로 가며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는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과연 그들이 꾼 꿈이 현실이 되며 진동했을 피비린내에는 얼마나 많은 함성과 오열이 도봉을 덮고 있었을까요. 노론(老論)의 영수(領袖)였던 우암 송시열이 새겼다는 글귀인 ‘도봉동문(道峯洞門)’ 바위가 곁을 흐르는 계곡에 덩그러니 남아, 영욕의 시대를 살다 사약을 받고 객사한 풍운의 정객(政客)이자 대학자의 덧없던 시대를 상기시켜 주기도 합니다. 생태탐방원 앞에 세워져 있는 광륜사(光輪寺) 경내에 들어가 산행을 무사히 마치게 해달라고 합장하는데 유동보살을 안고 있는 부처님이 지그시 바라보십니다.
오백 여 년 전 이 길을 걸어 관음암(觀音庵)으로 가며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는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과연 그들이 꾼 꿈이 현실이 되며 진동했을 피비린내에는 얼마나 많은 함성과 오열이 도봉을 덮고 있었을까요. 노론(老論)의 영수(領袖)였던 우암 송시열이 새겼다는 글귀인 ‘도봉동문(道峯洞門)’ 바위가 곁을 흐르는 계곡에 덩그러니 남아, 영욕의 시대를 살다 사약을 받고 객사한 풍운의 정객(政客)이자 대학자의 덧없던 시대를 상기시켜 주기도 합니다. 생태탐방원 앞에 세워져 있는 광륜사(光輪寺) 경내에 들어가 산행을 무사히 마치게 해달라고 합장하는데 유동보살을 안고 있는 부처님이 지그시 바라보십니다.
북한산국립공원도봉분소 앞의 이정표를 돌아 곧장 자운봉으로 향합니다. 다락원으로의 산행도 고려했으나 하산길에 다락능선을 타는 것으로 결정하고 곧장 발길을 뗀 자연관찰로에 어머니가 몰래 주는 사랑을 듬뿍 먹고 자라는 애기똥풀 군락지가 활짝 웃습니다. 그 사이 나를 보고 특유의 시니컬한 웃음으로 바라보는 시선 하나, 예! 대원군이 훼손하여 지금은 그 터만 남은 도봉서원의 옛터에 현실의 리얼리티와 모더니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술의 시인 김수영이 누워 있었어요. 대표 시인 <풀>을 베고 누워 오고가는 등산객들을 바라보는 시인의 눈에는 세상이 다 거기서 거기고 사는 것이 다 그렇고 그런 것이란 자조(自嘲)가 여전히 배어 있었습니다.
시인과 학자의 품격을 흠모해서일까요? 주위의 단풍은  교교한 풍미를 입가에 흘리며 안정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카시나무와 국수나무, 갈참나무 등 흔한 낙엽교목들이 길을 인도하는 곳에는 석굴암과 만월암이라는 암자도 있고 ‘자운봉 아래 천국이 여기요.’하는 천축사도 물론 있었지요. 수료생만 13,000명에 43년의 연혁을 자랑한다는 등산학교 문을 두드리려다 말고, 신라 의상대사가 세웠다는 천오백년 된 고찰(古刹)이자 서울시 유형문화재 347호인 목조삼가삼존불과 292호 비로자나삼존불도, 293호 비로자나삼심괘불도를 간직한 명 사찰인 천축사(天竺寺) 오백 나한의 미소를 받습니다. 오백 나한의 등 뒤로 가마득한 절벽을 이룬 선인봉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지요.
교교한 풍미를 입가에 흘리며 안정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카시나무와 국수나무, 갈참나무 등 흔한 낙엽교목들이 길을 인도하는 곳에는 석굴암과 만월암이라는 암자도 있고 ‘자운봉 아래 천국이 여기요.’하는 천축사도 물론 있었지요. 수료생만 13,000명에 43년의 연혁을 자랑한다는 등산학교 문을 두드리려다 말고, 신라 의상대사가 세웠다는 천오백년 된 고찰(古刹)이자 서울시 유형문화재 347호인 목조삼가삼존불과 292호 비로자나삼존불도, 293호 비로자나삼심괘불도를 간직한 명 사찰인 천축사(天竺寺) 오백 나한의 미소를 받습니다. 오백 나한의 등 뒤로 가마득한 절벽을 이룬 선인봉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지요.
천축사의 길게 뻗은 도량은 인생의 길고 긴 길에 새겨야 할 마음의 길이를 말해주는 것 같아 경건의 밀도가 꽤 깊어지더군요. 천축은 인도를 말함이지요. 불교의 발상지, 천축으로 가는 길에 도봉산의 자운봉이 구름에 가려 자색 빛을 하고 있으니 불교에서 말하는 상서로운 기운(紫雲)이 어찌 쏟아져 내리지 않을까요. 천축사를 나와 100m 남짓에 있는 마당바위로 향하는 길에는 이제는 몽우리가 진 나팔꽃이나 프렌치메리골드가 고개를 떨군 길가에 길고양이들이 여럿 무리지어 등산객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마당바위쉼터’는 여전히 아늑합니다. 그리 맑은 날은 아니었으나 주말을 이용한 도봉산 등산객의 반이 갈등을 겪는다는 마당바위에서는 앉아서 쉬거나 요기를 할 수 있는 공간에는, 모두 앉아 정성껏 사온 음식물과 음료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잠시 쉬며 물로 목을 축이는 사이 바람이 얼굴과 목덜미의 땀을 식혀주자 급격히 식어가는 체온은 자연히 여벌의 등산복을 꺼내게 합니다.
 마당바위부터 6~700여 m 자운봉 정상으로 향하는 길이 일명 깔딱고개지요. 무수한 바위와 난코스 돌길로 이어진 등반로는 아득하여 오히려 혼곤합니다. 중간에 있는 선인쉼터에서 준비해 간 감 하나를 베어 뭅니다. 잘 익은 감의 감촉은 여성봉의 편안함처럼 풋풋합니다. 한 300여 m 이어진 깔딱고개를 지나니 비로소 서울과 인근 도시들(의정부 양주)의 전경이 눈앞에 들어옵니다. 멀리 보이던 자운봉이 손에 잡히고 암벽을 타는 사람들의 모습이 부럽게 다가와 허리를 껴안습니다. 이제 자운봉을 끼고 설치된 계단을 차례로 오르면 암벽으로 오르는 것이 아닌 쇠기둥 난간에 의지하여 올라 기념할 수 있는 최고봉인 신선대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당바위부터 6~700여 m 자운봉 정상으로 향하는 길이 일명 깔딱고개지요. 무수한 바위와 난코스 돌길로 이어진 등반로는 아득하여 오히려 혼곤합니다. 중간에 있는 선인쉼터에서 준비해 간 감 하나를 베어 뭅니다. 잘 익은 감의 감촉은 여성봉의 편안함처럼 풋풋합니다. 한 300여 m 이어진 깔딱고개를 지나니 비로소 서울과 인근 도시들(의정부 양주)의 전경이 눈앞에 들어옵니다. 멀리 보이던 자운봉이 손에 잡히고 암벽을 타는 사람들의 모습이 부럽게 다가와 허리를 껴안습니다. 이제 자운봉을 끼고 설치된 계단을 차례로 오르면 암벽으로 오르는 것이 아닌 쇠기둥 난간에 의지하여 올라 기념할 수 있는 최고봉인 신선대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선대로 오르는 쇠기둥 난간 입구 국립공원 해설사가 서서 ‘코로나 방지거리를 유지하세요?’ ‘대기자들이 많으니 사진은 한 장씩만 찍으세요.’ ‘미끄러짐에 조심하시고 쇠기둥 난간을 꼭 잡고 지탱하세요.’ 등의 주의사항을 들으며 30여 분을 기다리며 신선대 표지석에서의 기념사진을 갈망하는 사이, 가능한 많은 조망을 눈에 넣거나 사진에 담아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자운봉의 기암괴석들은 어떻게 서로 떨어지지 않고 등과 등을 맞대고 있을까요. 삼형제 봉우리의 선조들은 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형제들을 어떻게 지키고 계실까요. 카메라가 아무리 좋아도 역시 눈으로 바라보는 조망(眺望)의 깊이는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여 등산이든 여행이든 우리는 시선이 거두기 힘든 그곳에서 풍경을 바라보며 ‘살아 있는 나의 생애’를 돌아보고 설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강암 기암괴석과 포대능선을 따라 흐르는 봉우리들의 행렬에 눈을 주는 사이 신선대 정상에 섰습니다. 어느새 북동풍으로 바뀐 바람의 농도는 더욱 짙어져 모자를 날릴 듯이 위협하는데, 해발 726m 정상 신선대의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등산객의 초라한 가슴으로 뿌듯함이라는 선물상자 하나가 배달되어 날아옵니다. ‘뒤에서 재촉하기 전에 어서 박아야지.’ 마음은 구중심천(九重深川)을 헤매지만 기다리고 있는 뒷사람들을 생각하며 표지석에 가지런하고 경건한 마음을 심습니다. 수직으로 내려가는 쇠기둥을 따라 정상을 올라왔다 내려가는 소년이, 올라올 때는 몰랐을 터이나 아득한 심연을 내려가려니 무서워서 어쩌지 못하고 쇠기둥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빠른 손놀림으로 다가가 그 소년의 앞으로 간 후 등에 기대게 하여 매우 위험한 신선대로 오르는 등반로 쇠 난간 구간을 벗어납니다. 소년의 파릇한 입술이 안타까웠습니다.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어머니에게 같이 목례를 하고 도봉산을 제대로 조망할 수 있는 봉우리인 주봉(柱峰)으로 가서, 서울 시내와 도봉산 능선을 에워싼 봉우리들의 힘찬 함성을 들으며 준비해 간 김밥 옆구리를 뜯으며 탁배기 한 모금을 마십니다.
화강암 기암괴석과 포대능선을 따라 흐르는 봉우리들의 행렬에 눈을 주는 사이 신선대 정상에 섰습니다. 어느새 북동풍으로 바뀐 바람의 농도는 더욱 짙어져 모자를 날릴 듯이 위협하는데, 해발 726m 정상 신선대의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등산객의 초라한 가슴으로 뿌듯함이라는 선물상자 하나가 배달되어 날아옵니다. ‘뒤에서 재촉하기 전에 어서 박아야지.’ 마음은 구중심천(九重深川)을 헤매지만 기다리고 있는 뒷사람들을 생각하며 표지석에 가지런하고 경건한 마음을 심습니다. 수직으로 내려가는 쇠기둥을 따라 정상을 올라왔다 내려가는 소년이, 올라올 때는 몰랐을 터이나 아득한 심연을 내려가려니 무서워서 어쩌지 못하고 쇠기둥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빠른 손놀림으로 다가가 그 소년의 앞으로 간 후 등에 기대게 하여 매우 위험한 신선대로 오르는 등반로 쇠 난간 구간을 벗어납니다. 소년의 파릇한 입술이 안타까웠습니다.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어머니에게 같이 목례를 하고 도봉산을 제대로 조망할 수 있는 봉우리인 주봉(柱峰)으로 가서, 서울 시내와 도봉산 능선을 에워싼 봉우리들의 힘찬 함성을 들으며 준비해 간 김밥 옆구리를 뜯으며 탁배기 한 모금을 마십니다.
어제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드는 힘은 서로의 든든한 어깨다.
종주하여 포대능선 길을 따라 오봉과 여성봉을 지나 도봉산에서 가장 난코스라는 Y계곡을 우회해서 사패산 너머 의정부로 가려는 애초의 계획은 늦은 산행 탓에 보류하고 다락능선으로 내려가기로 합니다. 가는 곳에 있는 기암괴석을 바라보는 즐거움도 함께 하기 위함이었지요. 포대정상에서 바라본 삼형제봉의 아름다움만큼 포대정상에서 보는 도봉산의 능선들과 북한산 사패산의 매력은 달콤한 모카커피를 연상하게 했습니다. 맑은 날이며 멀리 남한산성과 청계산까지 한 눈에 들어오겠지요. 도봉산이 한 눈에 들어오는 전망바위에 서서 다시 그 우수한 전경에 눈만 껌뻑입니다. 내려가는 도중 상어머리 형상의 바위, 돌고래 머리 모양을 한 바위, 석문과 각각 특색 있는 바위들의 시위에 에워싸이는 사이 눈앞에 미륵바위의 현신이 고즈넉하게 펼쳐집니다.
 그 바위 위에 서서 가까이 은석암과 양주 불곡산, 저 멀리 동두천의 소요산을 봅니다. 포대능선 아래 희미하게 보이는 망월사가 도봉의 어제를 말해주었다면 은석암의 작은 불상들은 작고 소중한 가치의 미학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진정 소중한 것은 거대한 발자국이나 출세가 아니라 내 곁의 가장 소중한 가치, 가족과 이웃이겠지요. 암릉 구간을 내려오니 어느새 다시 출발지인 도봉산 입구입니다. 송시열의 도봉동문(道峯洞門)처럼 올라갈 때 보지 못한 조선시대 김수증이라는 문인이 도봉 계곡에 새긴 ‘고산앙지(高山仰止)’라는 너럭바위가 눈에 들어옵니다. 공자가 재편집한 시경 300수에 나오는 문구로 ‘높은 산처럼 우러러 사모한다.’는 의미가 담겼답니다. 그래야지요, 나보다는 타인을,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인 것을 언제나 우러르고 사모해야지요. 국립공원산악박물관 앞에 있는 잘 익은 단풍나무에게 나의 길을 물어봅니다.
그 바위 위에 서서 가까이 은석암과 양주 불곡산, 저 멀리 동두천의 소요산을 봅니다. 포대능선 아래 희미하게 보이는 망월사가 도봉의 어제를 말해주었다면 은석암의 작은 불상들은 작고 소중한 가치의 미학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진정 소중한 것은 거대한 발자국이나 출세가 아니라 내 곁의 가장 소중한 가치, 가족과 이웃이겠지요. 암릉 구간을 내려오니 어느새 다시 출발지인 도봉산 입구입니다. 송시열의 도봉동문(道峯洞門)처럼 올라갈 때 보지 못한 조선시대 김수증이라는 문인이 도봉 계곡에 새긴 ‘고산앙지(高山仰止)’라는 너럭바위가 눈에 들어옵니다. 공자가 재편집한 시경 300수에 나오는 문구로 ‘높은 산처럼 우러러 사모한다.’는 의미가 담겼답니다. 그래야지요, 나보다는 타인을,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인 것을 언제나 우러르고 사모해야지요. 국립공원산악박물관 앞에 있는 잘 익은 단풍나무에게 나의 길을 물어봅니다.
 에필로그
에필로그
올해로 수령 165년이 되었다는 높이 18m 둘레 2m의 도봉산의 보호수인 은행나무와, 수령 215년 된 높이 17m 나무둘레 3.8m의 느티나무가 나란히 서서 도봉산의 길을 비춰주며 밤으로 인도합니다. 조선 중기 도봉서원을 창건한 유희경과 전북 부안 출신으로 황진이, 허난설헌과 더불어 조선의 3대 여류시인으로 추앙 받는 이매창의 시비(詩碑)에서 가야금 명창이 흘러나와 도봉산의 밤거리를 적십니다. 그 사이 산에서 내려온 산객들이 즐비한 도봉산역 홍등가에서 저마다의 목소리로 소주 혹은 탁배기의 유혹에 취하는 시간, 도시를 탈출한 각종 소음과 미세먼지, 그리고 도시의 어둠은 자운봉 암벽 등반로에 달린 도르레에 로프를 걸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화강암의 차별 침식으로 인해 형성된 암석의 박리면(剝離面)과 절리면(節理)이 고도로 발달된 천혜의 절경에 위치한 도봉산 천축사의 미륵보살에게 합장을 하며, 역으로 향하는 발길에 세종 때의 문장가이자 한성판윤(서울시장)을 지낸 서거정이 만장봉 아래에서 썼다는 ‘도봉산 수(秀)’ 한 자락이 떨어집니다.


![[크기변환]FB_IMG_1604586284525-300x146](https://media1.or.kr/wp-content/uploads/2020/11/크기변환FB_IMG_1604586284525-300x146-1-696x339.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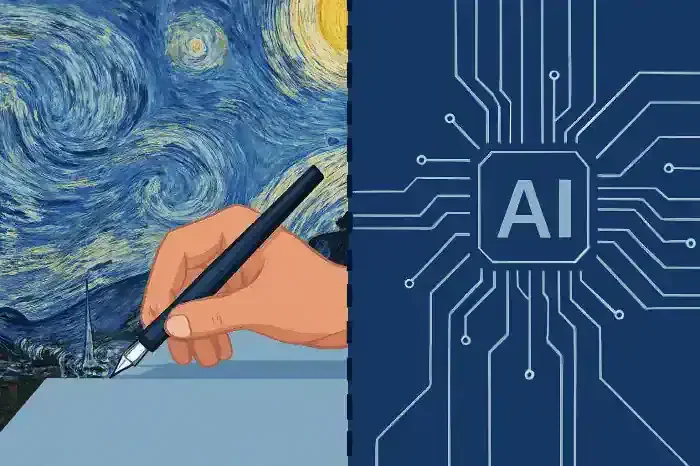
![[기획시리즈 | 한국사회와 노인] ② 창업이 아니라 추락이었다](https://media1.or.kr/wp-content/uploads/2025/06/A꾸미기85c7f0e2-cc2b-466a-b0f4-467a3300eb10-100x7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