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을 마시고 흥에 취하라
‘주봉지기천배소 화불투기반구다(酒逢知己千杯小 話不投機半句多)’. 10세기경 중국 북송 때의 문인 구양수(歐陽修)의 시다. 내용을 풀이하면 “술은 좋은 친구와 만나면 1000잔으로도 부족하고, 말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는 반 마디도 많다”라는 뜻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주당들도 예외는 아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밤새는 줄도 모르고 주거니 받거니 하며 술잔을 비운다. 모처럼 만난 친구 사이에 술 한 잔 없이 헤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술자리를 시작한다. 그러나 끝까지 화기애애해야 할 이런 술자리에서 가끔 사소한 말싸움이 씨가 돼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술도 음식이다. 적당히 마시면 신진대사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대인관계도 원만해져 복주(福酒)가 된다. 하지만 지나치면 건강은 물론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돼, 결국 친구도 잃고 몸도 상하게 하는 것이 술이다.
그런데 술자리에서 술을 자제하기란 고양이가 생선을 지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인가 공자도 “술 마시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고 했다. 도대체 술의 정체가 무엇인데 ‘주신(酒神·Bacchus)은 해신(海神·Neptune)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익사시켰다’는 말인가. 술의 정체는 화학적 구조로 볼 때 매우 간단한 물질이다. 탄소 2개, 수소 6개, 산소 1개로 돼 있다. 그런데 이 물질이 목줄기를 타고 넘어가는 순간 대뇌의 억제기능은 흐려져 이성의 기준이 느려지고, 중추신경의 억제기능도 무너져 일종의 해방감을 느낀다. 이런 기분 때문에 주당이 생겨나고, 그런 주당들은 퇴근 후 한 잔을 그리워하는지 모른다.
도대체 술의 정체가 무엇인데 ‘주신(酒神·Bacchus)은 해신(海神·Neptune)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익사시켰다’는 말인가. 술의 정체는 화학적 구조로 볼 때 매우 간단한 물질이다. 탄소 2개, 수소 6개, 산소 1개로 돼 있다. 그런데 이 물질이 목줄기를 타고 넘어가는 순간 대뇌의 억제기능은 흐려져 이성의 기준이 느려지고, 중추신경의 억제기능도 무너져 일종의 해방감을 느낀다. 이런 기분 때문에 주당이 생겨나고, 그런 주당들은 퇴근 후 한 잔을 그리워하는지 모른다.
불확실성시대를 살던 현대인들은 남달리 고뇌가 많았던 탓일까. 아니면 술을 마시면 솔직해지니 그랬을까. 주도(酒道)의 명인으로 불리던 공초 오상순(吳相淳·1894~1963) 시인은 당대의 문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거나하게 취해서 거시기(?)를 다 드러내놓은 채 대낮에 소를 타고 명륜동 거리를 광가난무(狂歌亂舞)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요즘 그랬다가는 경찰에 끌려가기도 전에 인터넷에 올라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객기보다 오늘날 주석(酒席)에서 사소한 말꼬투리를 잡아 주먹이 먼저 나가고 살인까지 서슴지 않게 된 것은 술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일찍이 시인 조지훈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인정을 마시고,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흥에 취한다”고 했다. 당(唐)나라의 시인 이백(李白)은 ‘술을 대작하며’란 시에서 “권하는 술잔을 거절 말게나/ 봄바람 웃으며 불어오거늘/ 복숭아 오얏나무 구면식이라/ 꽃송이 고개 숙여 우리를 보네…<중략>…자네 술 마시지 않다니 뉘라 불로장생했던가?”라고 노래했다. 술 한 잔을 마셔도 풍류가 있고, 멋이 있는 친구와 말벗하며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요즘 사람들은 이른바 상주(商酒) 즉, 비즈니스 술대접은 잘해도 멋있고 인정 넘치는 술자리는 잘 못 만든다. 고관대작이나 재벌들이 돈 버리려 가는 술집이 아니라도 좋다. 허름한 목로주점에서 탁배기 잔이라도 기울이며 “요즘 자네 어떤가, 살기가 팍팍하진 않은가, 어려운 일 있으면 말해보게, 내 힘자라는 데까지 도와보지…” 하는 등의 인정을 베푸는 것이 옛 어른들의 술자리가 아니었을까.
우리민족은 흥이 넘쳐나는 민족이다. 월드컵경기에서 4강에 들었을 때를 보라, 붉은 악마가 대한민국을 뒤덮지 않았던가. 누가 시켜서인가. 아니다. 흥에 취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의 술자리도 인정이 넘치고 흥에 취하는 문화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자녀들이 술 마실 나이가 되면 부모가 솔선해 술을 가르치는 풍습이 생겨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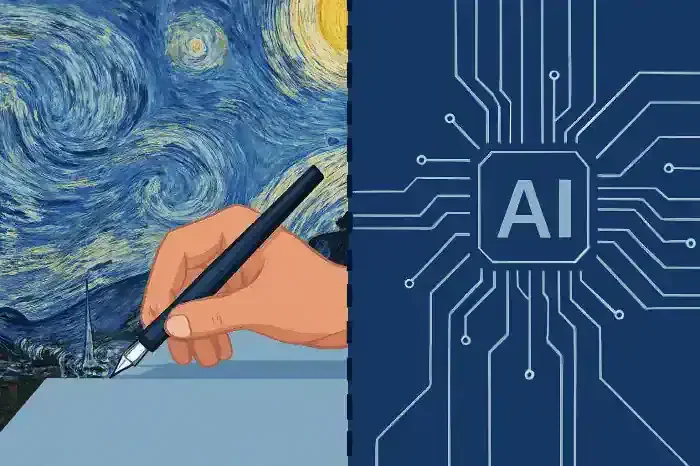
![[기획시리즈 | 한국사회와 노인] ② 창업이 아니라 추락이었다](https://media1.or.kr/wp-content/uploads/2025/06/A꾸미기85c7f0e2-cc2b-466a-b0f4-467a3300eb10-100x7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