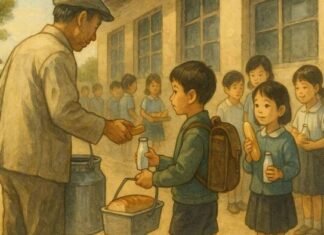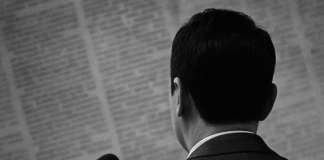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잇다, 서울 성곽길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잇다, 서울 성곽길
느린 걸음으로 오른 서울 성곽길에서 세월의 자취를 두루 살피다.
글·사진 이정찬(미디어원 발행인)
올해가 가기 전 한 번쯤은 서울 성곽길을 걸어보고 싶었다. 이는 물론 풍경의 아름다움에 반한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역사와 전통이 현재와 절묘하게 어우러진 모습을 온전히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서울 성곽은 높이 12m, 총연장 18km의 타원형으로 축조되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한 후 한양 도성을 외적이나 도적의 침입으로부터 막고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건설했으며, 이후 1422년 세종대왕에 의해 돌로 축조되고 활 총을 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고 한다.
4개의 대문, 인의예지로 명명한 흥인지문 돈의문 숭례문 숙정문과 4개의 소문, 혜화문 소의문 광희문 창의문으로 출입을 했다 하며 현재 돈의문과 소의문 광희문은 그 터만 남아 있을 뿐이다.

느린 걸음의 첫발은 동소문이라고도 불리던 혜화문에서 내려놓았다. 성문은 더 이상 길을 연결하는 중심에 있지 않고 굳게 닫혀 있을 뿐이다. 혜화문에서 서울과학고까지의 성곽길은 건물의 담벼락으로, 축대로, 아픈 과거의 모습 그대로 천년을 이어가고 있었다. 일제는 식민지배의 시작과 동시에 개발을 명목으로 성곽을 훼손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해방과 한국동란 등의 혼란기를 거치면서 더욱 쇠약해졌다.
서울과학고 초입부터 다시 시작되는 성곽길은 늦가을 단풍이 한창이었다. 서울 사람으로 수십 년을 살아왔건만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이 있는지는 미처 몰랐다.
잠시 끊어졌던 길은 다시 이어지면서 계절의 들고 남을 온몸으로 내보인다. 오랫동안 짝을 잃었던 석축은 100년이 지나 다시 새로운 짝을 만났으니, 과거와 현재의 만남, 길고 긴 기다림의 가치가 고스란히 느껴진다. 천년의 세월을 넘어 함께 길이 되고, 또 다른 천년을 함께 기약하니 ‘의구한 산천’의 일부가 되고 마는 것이다.
성곽길의 오른편으로는 돈암동과 성북동이 따라온다. 고층 아파트와 주택, 빌라로 빼곡한 도시는 지난여름 풍성하게 입었던 초록을 모두 내려놓고 본래 모습인 잿빛으로 돌아왔다. 붉고 노란 가을이 함께하는 말바위 안내소까지 2.5km 남짓한 길은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 맺힐 정도의 기분 좋은 산책길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에 좋다.

말바위 안내소에서 등록을 하고 비탈길을 200m가량 올라가면 서울의 북대문인 숙정문이 문을 활짝 열어 놓고 나그네를 기다린다. 도성 한양을 찾는 경기 북부 지역 사람들이 많이도 드나들었을 숙정문이다.
하지만 오늘 활짝 열린 숙정문에서는 소통은 더 이상 찾을 수 없고, 길은 더 이상 길이 아니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어린 아들을 목마 태운 나이 지긋한 아버지는 아이에게 지난 세월을 가르쳐 주며 성곽 이곳저곳을 살핀다. 그리고 길은 아버지에게서 다시 아이로 이어지는 세월의 자취를 품는다.
숙정문에서 1.2km 남짓한 길을 걷다 보면 청운대가 나온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한눈에 조망되는 멋진 곳이지만 오늘은 시계가 짧아 사진에 담을 수는 없다. 청운대의 근무자는 청명한 날이면 서울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을 거라며 꼭 다시 찾을 것을 권유한다.
청운대를 뒤로하고 북소문인 창의문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늦은 오후에 시작한 여정으로 제한된 개방시간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다. 서울 성곽길 중 일부 구간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오후 5시 이후에는 출입할 수 없다.

바삐 디디던 발걸음을 북악 쉼터에서 잠시 멈추고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상념에 잠긴다. 본시 성곽은 소통이 아니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무한 소통의 시대인 21세기의 서울성곽 역시 단절 그 자체임을 확인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졌다.
한양 도성을 도적이나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막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자 축조된 서울 성곽이 수백년 지난 오늘날에는 나라님과 민초의 사이를 빈틈없이 갈라놓는 또 다른 단절의 상징이 된 셈이다.
북악 쉼터에서 창의문까지의 길은 가파른 계단길이다. 젊은이들은 983계단에 도전해 보기 위해 창의문부터 이어지는 길을 택한다. 아마도 험한 길 끝의 성취감을 맛보기 위함일 테다.
서울에서 가장 시간이 더디게 간다는 부암동이 보이고 감나무, 단풍나무가 제법 울창한 구기동이 보이더니 어느새 창의문이다. 이제는 그만 걸음을 멈춰야 할 때. 저 멀리 또 다른 길로 여정을 이어가는 나그네의 뒷모습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