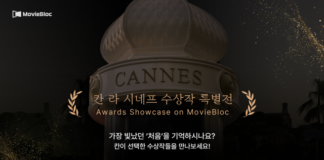‘팔만대장경의 뒤안길’
달비골의 진달래는 올해도 어김없이 봄바람에 온산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달성 비슬산에서 제자 무극과 함께 남행길을 떠난 일연은 한 달여 만에 멀리 관음포가 바라다 보이는 하동 포구의 밤을 작은 암자에서 보냈다.
먼동이 틀 무렵 일연 일행은 남해의 고현면 대사리 관음포쪽에 배를 대었다. 그곳에는 정안(鄭晏) 거사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마중 나와 있었다.
“대선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남해를 찾아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고단하실 텐데 수레에 오르시지요.“ “아닙니다. 이제까지도 잘 걸어왔는데요.”’
일연은 무극을 앞서게 하여 곧장 갈 길을 재촉하였다. 배를 댄 포구에는 바다 물속에 떠 있는 벚나무며 자작나무, 후박나무들로 마치 등을 내민 고래처럼 보인다. 더러는 바람에 밀리면서 등을 부딪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가슴이 답답하면서도 설레는 심사를 누를 길이 없었다. 하루 빨리 팔만대장경을 완성하여 불력으로 원 나라의 침략을 막아 내겠다는 결심은 벌써부터 일연을 흥분시키고 있었다. 속이 부글거린다.
그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정림사 남해 분사도감 증의(證義) 일을 맡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가 정림사에 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도 정 거사는 아무 말이 없었다. 일연은 아무 할 일 없는 사람 모양으로 판목 만드는 곳과 새기는 곳을 오가며 서성거리기만 그러나 밤이 되면 촛불을 밝혀놓고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무극은 그러는 스승이 답답하기만 했다.
“스승님! 무슨 글을 이렇게 밤새워 쓰십니까?” “정말 할 일이 너무나 많다네. 자네의 할 일도 그럴 것이야.” “저도요?” “그렇다네. 자넨 내일 날이 밝으면 글자 새김을 하는 각수들 가운데 명장 몇 사람을 골라 정 거사에게 청하시게. 적당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야. 시간이 그리 많지 않네.”
“그들을 골라서 뭘 하게요?”
“차차 알게 될 걸세.”
“알겠습니다.” 달포가 지났을까. 그는 각수 열 명을 데리고 왔다. 일연은 조촐한 차 자리를 만들고는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 멍석을 깔아놓고 둘러앉게 하였다.
“일은 잘 되어 갑니까?” 성급한 중씰한 각수가 성급히 물었다.
“워낙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 들쭉날쭉 하여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면 훨씬 정확하고 빨리 할 수 있을 겁니다.”
늙수그레한 각수가 맞장구를 놓는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오시라 하였소. 내가 그 동안 분사도감에 와서 증의를 하면서 적어놓은 기준들을 정리한 것이니 무극스님에게 설명을 듣고 궁금한 것이나 보탤 게 있으면 이야기해 줘요. 그러고 나서 책자로 만들어 더 많은 증의 과정을 하나의 잣대로 끝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듯하오. 나 혼자 하는 데는 한계가 있소이다.”
둘러선 대중들이 일연이 적은 글을 바라보고는 경탄했다.
“언제 그 많은 글을 다 쓰셨습니까?”
놀랍다는 눈치였다. 역시 대선사다운 처사였다. 그는 몇 차례 토론을 거쳐 팔만대장경을 만드는 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속내를 적은 내용을 판각하여《대장수지록(大藏須知錄)》이란 책을 찍어냈다. 물론 남해 분사도감 현지에서 찍었다.
정 거사와 함께 몇 사람이 모여 간단한 예불을 한 뒤 선방에서 차를 나누었다. “거사님. 이번에 제가 대장경판 교열에 필요한 《대장수지록》이란 책자를 3권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지요.”
책장을 넘기는 정안의 얼굴에는 놀랍고 너무 반가운 일이었다.
“선사님! 언제 이런 글을 쓰셨습니까?”
“이제 글을 알고 눈 밝은 사람들을 뽑아 이 책으로 훈련을 하면 저와 똑 같이 증의를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1~2권은 경(經)에 관한 것이고 3권은 율(律)과 논(論), 그리고 종경록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은 쓸 수 있겠지만 차츰 보탤 부분을 찾아내야 하니 시간을 내시어 반드시 살펴주셔야 좋을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집사 !, 선사님이 지으신《대장수지록》공부할 사람들 우선 열 명만 알아봐 주시게.”
열 명의 증의가 새로 생겨났다. 만들어내는 판목을 미쳐 증의 과정이 못 따라 가서 일이 늦어지곤 하였는데 이제 그런 일은
없게 되었다.
정림사로 온 지 두어 해가 흘렀다. 증의를 다 마친 판각들은 배에 실려 강화도 대장도감으로 실려 갔다. 대장도감의 총책임을 맡은 수기(守其) 총통은 말할 것 없고 고종은 한 시름 덜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너무 기뻐하였다. 난리 통에 국고가 거의 비어 있을 지경이었으나 고종은 특별지원금을 남해 분사도감에 보내도록 하였다.
“스승님! 대장도감에서 왕명으로 50석의 쌀을 보내왔습니다. 스승님 앞으로요.” “손발이 터지도록 일하는 사람들에게 먹이고 입히는데 다 쓰도록 하게나. 거사님에게 알려드리고 상의를 한 후에 집행하시게.” “스님은요?” “나야 부족할 게 없네.”
밤이 늦도록《대장수지록》을 놓고 공부를 하며 그 기준으로 판각을 살피는 젊은 증의들의 판각 넘기는 소리며 목도로 판목을 옮기며 영차영차 하는 소리와 독경을 하는 소리에 어울려 온 대사리 절골 마을에 저녁 안개처럼 퍼지고 있었다. 바람 없는 관음포 앞 바다에 추승달이 얼굴을 드리워 웃고 있었다. 대장경 작업을 살피는 고현 마을이 달빛에 젖고 있었다.〔
참고문헌 :《보각국사비첩》〕
지은이 소개 정호완(鄭鎬完)
정호완(鄭鎬完)
대구대학교 명예 교수. 시조시인
삼국유사학회 대표. 세종대왕사업회 역주위원.
경북문화상. 시조문학 작가상.
저서: 우리말의 상상력 외 30여권
hwjeong@dae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