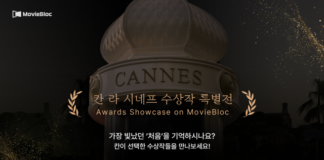잔뜩 흐리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집니다. 나는 주천교(酒泉橋) 위에 서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강이 흐릅니다. 주천강(酒泉江)이라고 부릅니다. 물안개 뒤섞인 강은 빗물과 섞여 비릿한 느낌을 주는데 싫지가 않습니다.
평창․횡성․홍천의 경계에 있는 태기산(泰岐山)에서 발원한 주천강은 횡성군 강림면(講林面)과 영월군 수주면(水周面)·주천면을 거쳐, 서면(西面) 신천리(新川里)에서 평창강(平昌江)과 만나 서강(西江)으로 이름을 바꾼 뒤, 다시 동강(東江)과 만나 남한강이 됩니다. 길이 95.40㎞, 유역면적은 608.42㎢에 이릅니다.

주천(酒泉)이라는 샘물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 이 샘에서는 술이 나왔지요. 양반이 찾아오면 약주(藥酒)가, 천민이 오면 탁주(濁酒)가 나왔다고 합니다. 때는 조선시대. 한 천민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양반 복장을 하고 가면 무슨 술을 내어줄 지 궁금했던 겁니다. 어렵지 않게 양반 복장을 갖춰 입고 그 샘 앞으로 가서는 약주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정말 약주가 나왔을까요? 그 천민 앞에는 여전히 탁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잔뜩 화가 난 그는 단번에 그 샘터를 부숴버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술샘에서 술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맑고 찬 샘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조선 성종 때 편찬된 인문지리서(人文地理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주천샘에 대한 이야깃거리가 소개돼 있습니다.
“주천석(酒泉石), 주천현 남쪽 길가에 돌이 있으니 그 형상은 반 깨어진 술통과 같다. 세상에 전해 오는 말로는 이 돌술통은 예전에는 서천(西川)에 있었는데 그곳에 있을 때는 술이 많이 나왔다. 그런데 현(縣)의 아전이 술을 마시려고 그곳까지 가는 것이 싫어서 현 안으로 옮겨놓기 위해 여러 사람이 함께 옮기는데 갑자기 우레와 함께 벼락이 떨어져 술샘이 세 개로 나누어졌다. 한 개는 못에 잠기고 한 개는 지금 남아있는 주천샘이고, 다른 하나는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
1447년(세종 29년)에 문과에 급제해 형조․이조․공조판서를 지낸 일제(逸薺) 성임(成任․1421~1484)은 주천석의 샘물을 놓고 시를 지었습니다.
술이 있어 샘물처럼 흘렀다네.
똑똑 물방울처럼 떨어져 바윗돌 사이로 흘러드는가 하였더니
어느 사이에 철철 넘쳐서 한 통이 다 찼다네.
술 빚은 것이 누룩의 힘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그 맛은 자연 그대로라네.
한 번 마시면 그 기분이 맑은 하늘 위에 노니는 것 같고,
두 번 마시면 꿈속에서 봉래산(蓬萊山)의 빈터에 이르게 되니라.
줄줄 흘러 써도 써도 마르지 않으니,
다만 마시고 취하는 대로 만족할 뿐 어찌 값을 말하였으랴.
당시에 고을 이름 붙인 것도 다 뜻이 있었으리.
마침내 산 속의 귀신들이 우레와 폭풍우로 한 밤중에 술샘을 옮겨 버렸네.
옥검(玉檢)을 위하여 깊은 동학(洞壑)에 폐쇄한 것이 아니면,
반드시 금단지에 저축하여 깊고 깊은 연못에 감추었으리라.
감감하고 비어서 나민 자취 다시 볼 수 없게 되었고,
오직 끊어진 돌 조각만 길가에 가로놓였네.
내 하늘을 되돌려 옛날 샘의 맥(脈)을 돌려놓고자 하거니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군침 흘리지 말게 하라.
내가 원하는 것은 천도복숭아를 안주삼아 밝으신 임금께 바치고,
한 잔을 올리면 천년의 수(壽)를 하려니,
일만 잔 올린다면 다시 만만세(萬萬歲)를 기약하리니,
길이 법궁(法宮)에 납시어 신선과 만나소서.
나는 왜 주천강에 왔을까요. 무엇이 보고 싶었을까요. 정말 술이 나올 줄 알았을까요?
주천강에서 탁주 냄새가 나는 걸 보니, 나는 생전에 천했나봅니다.
글 김원하
교통정보신문 발행인
자료참조 〈영월 땅 이름의 뿌리를 찾아서〉엄흥용,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