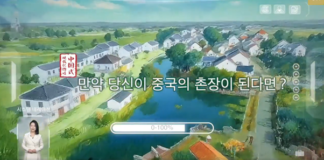쌀은 나와 당신의 존재를 구속하는 물질 양식입니다. 쌀은 모두의 목젓이고 뱃속 귀빈이지만, 그 모두에게 자신을 그리 쉽게 허락하는 손님은 아닙니다.
한 줌의 쌀을 얻게되면 우리는 그 안큼의 자유를 잃지만, 생활에서 발견되는 본능은 항상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아발견의 욕구를 능가하니, 쌀에게 자유의 내어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한 줌의 쌀에게 내어 준 자리의 귀퉁이에는 거울처럼 명징하고 신비로운 향기가 있지요. 하여, 정박한 폐선과 같이 낡고 초라한 사람의 마음 속 간이역에도 가끔은 쾌속열차의 경적 소리가 들맇 수 있는 것입니다.
살다보면 가능성이 희박한 일에도 극적인 패러다임이 연출되듯이, 이미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난 과학도 진리로 귀결되기 전에는 얼마든지 또다른 진실의 메스가 칼날을 들이밀지 모르는 일임을 우리는 배우고 삽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음악가인 모짜르트에게 가족은 불가근 불가원, 겁나먼 동토의 일그러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이에도 모짜르트는 어머니가 죽자 [피아노 소나타 A단조]의 가장 슬프고 애련한 음악을 헌사하며 슬퍼했지요.
현재 내가 가진 것이 아무 거도 없다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나침반의 바늘을 거꾸로 돌리며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름지기 군자(君子)란? ‘마음이란 창고에 자비(慈悲)를 담고 사는 사람’이니, 까짓 자유를 위하여 쌀 한 줌쯤 던져버린 듯 무엇이 그리 허허로울까요.
허나, 군자의 도나 의리와 협객의 삶의 근본도 생명의 탄생이었으니 세상 속에서 나를 꿈틀거리게 해 준 가족의 존재는 곧 나와 같은 아련한 심장이겠지요. 하여, 오늘도 우리는 기꺼이 한 줌의 쌀을 위하여 자유를 잃을 수 있는 것일 겁니다. 정도의 차이야 물론 사람별로 다 다르겠지만 말이지요.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다시 서걱서걱 내리고 있는 날이지요. 좀처럼 깊은 잠을 허락하지 않는 잠의 신 휘프노스가 얄미운 계절입니다. 그러나 시절이 아무리 수상하고 번다(煩多)한 사연이 허리를 휘감는 질풍노도의 사회지만, 여전히 유효한 인간의 믿음은 오로지 한 줌의 쌀과 따뜻한 심성이겠지요.
부끄럽지 않게 획득한 “나만의 쌀” “나만의 가슴”이 선택한 밝은 사회를 동경하는 마음 말이지요.
박철민 작가/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