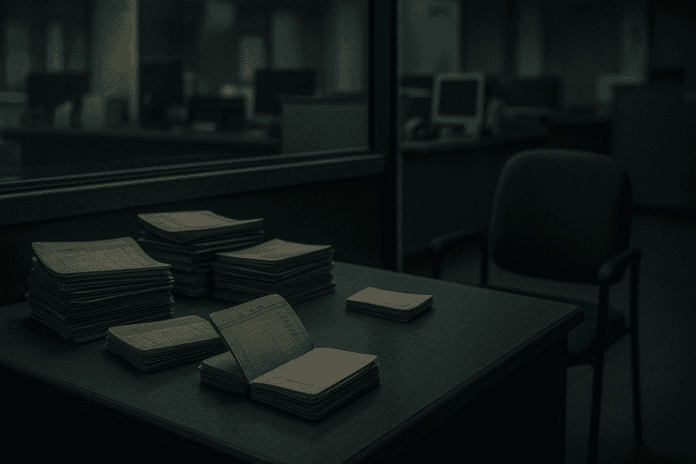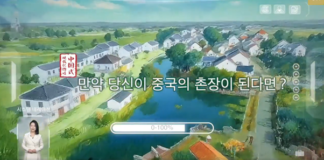김은행 씨의 어머니는 생전에 여섯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치매를 앓기 전 자식들이 드린 돈을 모아, 가끔은 손주에게, 가끔은 자식이 힘들다 하면 몰래 꺼내어 주곤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 절차가 시작됐다.
김 씨는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서류를 갖추고 농협을 찾았다.
담당자는 상속 가능 예금 총액을 계산했고, 상속인인 오빠가 이를 수령했다.
그러나 며칠 뒤, 김 씨는 기억에 남아 있던 특정 계좌 둘이 내역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김 씨는 어머니와 함께 은행에 가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했을 때 받은 전체 계좌 목록을 사진으로 저장해두고 있었다.
그 자료를 근거로 누락된 계좌를 지목했지만, 은행은 “그건 우리 지점 관할이 아니다”라며 본점과 고객센터로 책임을 넘겼다.
정보보호의 이름으로 침묵하는 시스템
금융기관은 종종 ‘정보보호’를 근거로 사망자의 계좌 현황에 대한 고지를 유보한다.
그러나 이는 정보보호의 취지를 오용한 관행에 불과하다.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일정 기간 이후 자동으로 소멸되며, 민법상 상속인이 명시되었을 경우 그 권리는 해당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은행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별도 소명자료’를 요구하며 적극적인 안내나 고지를 하지 않는다.
이는 유족이 이미 관계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인감, 사망진단서 등)를 제출했음에도, 계좌 조회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다.
결국 침묵은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화된 대응이다.
고지의무의 부재 – 법의 구멍
현행 금융 관련 법률에는 ‘고객 사망 시, 모든 예금 계좌를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명시적 의무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은 단순히 계좌 내역을 누락시키거나, 잔액이 얼마인지조차 고지하지 않은 채 ‘회계적 정리’로 끝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고객 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접근권과 결정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며, 재산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더구나 ‘잡이익’으로 처리된 예금은 상속 등기 없이 은행의 수익으로 전환되며, 회계상 “기타영업외이익”이라는 항목으로 잡힌다.
즉, 고객의 돈이 은행의 영업외수익으로 전환되는데도,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동의 절차는 없다.
유족 계좌 통합 조회 제도는 왜 현실화되지 않는가
금융당국은 수년 전부터 “유족 계좌 통합 조회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여전히 제도는 시범 단계 혹은 민원 중심의 수동 절차에 머무르고 있다.
유족이 직접 각 금융기관에 일일이 연락하고,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 등을 제출해야 부분적으로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는 고령사회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
더구나 치매 환자나 독거노인의 경우, 가족조차 계좌 존재를 알지 못하는 일이 많아 “몰랐기 때문에 못 찾아간 예금”이 자연스럽게 ‘잡이익’으로 전환된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제도 설계 자체가 소극적이었음을 반증한다.
우리는 왜 이 사건을 다시 기록해야 하는가
김 씨의 사례는 하나의 사례로 끝나지 않는다.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치매 인구의 급증은 이와 같은 ‘묻지 않으면 사라지는 예금’ 문제를 앞으로 더욱 보편적인 사회 문제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계좌를 몰라서 못 찾은 개인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 제도는 구조이고, 구조는 설계의 결과다.
고지를 의무화하지 않은 금융법, 정보 제공의 책임을 피하는 금융기관,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침묵하는 시스템. 이 세 가지가 작동한 결과, 유족 예금은 수익 항목으로 조용히 흡수된다.
미디어원 한마디
법이 묻히는 순간, 사람의 삶도 묻힌다.
잡이익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붕괴다.
2025년 5월 | 미디어원 단독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