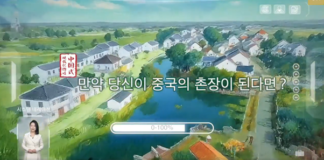기획 연재를 시작하며
노인이라는 단어부터,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
2025년,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2%, 약 1,060만 명에 달한다. 유엔이 정의한 초고령 사회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앞으로 10년 내 25%, 2045년에는 33%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거대한 인구 변화를 우리는 여전히 하나의 단어로만 부른다. 바로 ‘노인’이다.
‘노인’이라는 말은 너무 오랫동안 익숙하게 사용되어 왔다. 건강한 68세 골퍼도, 요양시설에 누운 92세 어르신도 행정과 언론 앞에서는 똑같은 ‘노인’으로 묶인다.
문제는 이 단어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제도와 행정이 만든 분류의 언어이며, 사회가 편의적으로 설정한 기준이다. 그 안에는 개인의 삶, 노동, 희생은 지워져 있다. 존중보다는 규정에 가깝고, 인격보다는 제도의 대상으로 작동한다.
우리는 너무 오래 ‘노인’을 복지의 수혜자, 예산의 부담으로만 취급해왔다. ‘노인’이라는 단어는 그 모든 것을 함축해 표현한다. 기초연금, 무임승차, 장기요양 등의 제도가 생존을 위한 최소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마저도 과하다는 시선이 있다. 하지만 정말 그 혜택이 과한 것일까? 혹시 우리 사회가 이 세대가 감당한 의무와 기여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징병, 납세, 산업화, IMF 구조조정— 한국 사회의 근간을 버텨낸 세대에게 지금 사회는 어떤 보답을 하고 있는가?
‘노인’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 기능을 다했다. 이 단어는 존경을 담기보다는 낙인을 찍고, 보호보다는 분리를 강화하며, 정책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이 기획은 질문에서 시작한다. ‘노인’이라는 말이 만들어낸 오해와 혐오, 그리고 그 단어 속에 갇힌 수많은 현실을 다시 바라본다. 이 단어 하나가 사회를 어떻게 나누고, 누군가를 대상화했는지, 그리고 어떤 언어가 필요한지 묻는다.
10회에 걸친 이 연재는 ‘노인’이라는 단어에 갇힌 사람들의 삶을 다시 펼쳐보려 한다. 단어를 바꾸는 일은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가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제, 단어 하나부터 다시 묻는다. 지금 우리 사회가 부르고 있는 ‘노인’은 누구인가.
연재는 총 10회로 구성되며,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화: 노인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행정의 도구가 되었는가 – 제도화된 호칭, 구조화된 혐오
2화: ‘노인’이라는 단어가 불편한 이유 – 낙인의 언어, 위계의 프레임
3화: 세계는 왜 ‘노인’이라는 말을 버렸는가 – 언어 감수성과 복지 철학의 차이
4화: IMF 이후, 일터에서 밀려난 세대 – 조기퇴직과 제도 외부화의 시작
5화: 의무의 세대, 보상의 실종 – 병역·납세·산업화를 견딘 세대에게 사회는 무엇을 돌려주었나
6화: ‘혜택’이라는 말이 복지를 가난하게 만든다– 복지의 프레임 왜곡과 정치적 언어 전환
7화: 지하철 무임승차는 공짜가 아니다 – 이동권은 생존권이다
8화: 언론은 왜 노인을 혐오하게 되었나 – 뉴스와 예능 속 프레임 재생산 구조
9화: 숫자만으로 사람을 정의할 수 있는가 – ‘65세’ 기준의 허구와 생애주기적 접근의 필요
10화: ‘노인’이라는 단어는 폐기되어야 한다 – 언어, 제도, 시선의 리셋 선언
미디어원 l 기획취재 팀
다음 주 ① 노인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제도의 꼬리표가 되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