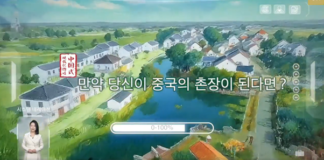하지만 우리는 정말,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가?
법은 60세를 보장하지만, 현실은 53세에서 멈춘다
(미디어원=이정찬 기자) 2013년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지 10년. 하지만 “60세까지 안정적으로 일한다”는 문장은 오늘날 대한민국 노동시장에서는 허구에 가깝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55~59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정년 이전에’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했다.
이직도 아니고, 자발적 퇴직도 아니다. 조기퇴직, 명예퇴직, 권고사직—모두 회사가 먼저 문을 닫았다.
정년은 제도상 존재하지만, 현실에선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60세를 65세로 늘리겠다고 한다.
정년 연장의 수혜자는 정년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정년 연장의 진짜 수혜자는 누구인가. 공공부문 정규직, 대기업 고연봉자, 연금이 보장된 ‘노후 상위 10%’다. 이들은 정년이 오기도 전에 이미 노후 준비가 끝나 있거나, 계속고용이 가능한 집단이다.
반면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 무연금층 고령자에겐 정년이란 제도 자체가 없다.
정년은 ‘선택받은 계층’에게만 작동하는 혜택 장치가 되어가고 있다.
정년이 없는 이들에겐 연장도 없다. 이 불균형을 고치지 않고 정년 연장만 논의하는 것은 정책 포퓰리즘에 가깝다.
고용의 신뢰 없이 정년만 늘리면, 갈등은 커진다
문제는 정년 자체가 아니라, 그 정년까지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의 부재다.
지금처럼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고, 기업에 부담만 더하는 방식이라면
기업은 자연스레 조기퇴직→외주화→정년 포기의 악순환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더불어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과 직결된다.
2016~2024년 사이, 55~59세 근로자는 증가했지만, 23~27세 청년 근로자는 감소했다.
세대 간 일자리 충돌이 이미 통계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세계는 어떻게 정년을 다루는가
정년은 단지 ‘숫자’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노동 선진국들은 고령화 속에서도 정년 그 자체보다,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바꿨다.
국가 제도 방향 핵심 특징 일본 정년 60세 유지 + 계속고용 의무화(65세까지) 정년 도달 시 퇴직 아닌 재고용 필수, 임금 낮춰 지속 고용 독일 정년 명시 없음 (연금 수급 67세) 탄력근무, 직무 전환 중심 / 은퇴 전 퇴직 협상 미국 정년제 법률로 금지 Age Discrimination 법에 따라 정년 강제 자체가 불법 영국 정년제 폐지(2011) 은퇴 나이 자율 / 고령자 권리 보장 중심 프랑스 정년 62세 → 64세 개편 중 정년과 연금 수급 연동 논쟁 / 사회적 합의 중시 →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정년 숫자’보다 ‘고용 구조 개편’에 방점을 둔다.
정년보다 ‘노동 생애’를 다시 설계할 시간
이제는 정년을 늘릴 것인가 아닌가의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다.
-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
- 고령자 재배치·재교육 시스템 도입
-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계속 고용 모델’ 설계
착시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
정년 연장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60세를 못 채우는 나라에서 65세를 논하는 건, 현실을 가리는 착시와 같다.
제도 설계자의 시야가 아닌, 현장에서 밀려난 노동자의 경험에서 출발하지 않는 한,
‘정년 연장’은 해법이 아니라 또 하나의 불신만 남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