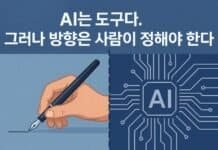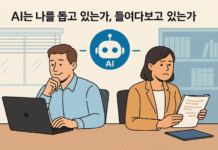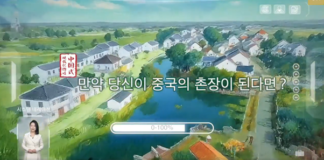(미디어원=이정찬 기자) 직장인의 71.3%가 AI 도구를 사용 중이라는 통계가 나왔지만, 여전히 3명 중 1명은 AI를 사용하지 않는다. 기술은 이미 일터에 들어왔고, 쓰는 사람은 날마다 생산성을 체감한다고 답한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그 세계’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 단순한 무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사용 격차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엘림넷 나우앤서베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AI 플랫폼의 업종별 사용률은 IT/소프트웨어(92.5%), 미디어/콘텐츠(76.9%), 교육(73.3%) 분야에서 매우 높았던 반면, 유통/물류(61.3%), 공공/행정(62.2%), 서비스업(63.7%)은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절반에 가까운 직군에서는 여전히 AI 도구가 ‘내 일과 무관한 기술’에 머물러 있다.
왜일까? 첫 번째 이유는 조직 문화다. 공공기관이나 전통적 유통기업에서는 디지털 도구를 개인이 자율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위에서 지시하면 한다’는 수직적 구조는 AI처럼 자율성이 전제된 기술과 충돌한다. 누군가 허락하지 않으면 AI조차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문화가 존재한다.
두 번째는 교육의 부재다. AI 도구는 손에 쥐어져 있어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 특히 40~50대 관리자층은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며, AI는 ‘젊은 직원들이 쓰는 것’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조직 내에서 AI 사용이 특정 연령층, 특정 직무에만 편중되는 ‘기술 계층화’ 현상이 나타난다.
세 번째는 실제 접근성의 문제다. 일부 직장에서는 보안, 규정, 라이선스 등의 이유로 외부 AI 도구 사용이 제한되거나 아예 금지되기도 한다. 나우앤서베이 조사에서도 ‘AI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는 응답이 2.9%에 달했다. 도구는 인터넷에 있지만, 정작 열어볼 권한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격차는 결과적으로 생산성에서도 차이를 만들어낸다. 같은 조사에서 ‘AI 도입으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답한 비율은 매일 AI를 사용하는 집단에서 67.4%에 달한 반면, 주 1회 이하로 사용하는 집단에서는 단 6.9%에 그쳤다. AI 사용 빈도가 성과 차로 이어진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조직이 AI를 적극 도입하고, 리더가 먼저 모범을 보이며, 구성원 전체를 위한 교육과 실습 기회를 제공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 AI는 개인의 의지보다 조직의 의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기술이다.
AI 시대는 이미 도래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술을 ‘쓸 수 있는 사람’과 ‘쓸 수 없게 되는 사람’의 간극은 벌어지고 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역설적으로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