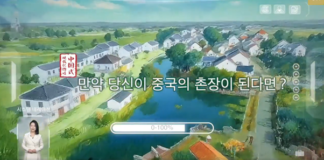어느 외국인은 “한국인은 시도 때도 없이 술을 마신다”고 평했다. 지나친 말은 아니다. 기뻐서 또는 슬퍼서 술을 마신다. 계절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비가 내리면 비 온다고 술을 마신다. 보름달이 하도 밝아서 달과 벗하며 마시기도 하고 뜰에 핀 국화가 하도 좋아 술을 마신다.
그래서인가 일찍이 권일송(權逸松?1933~95) 시인은 ‘이 땅은 나를 술 마시게 한다’고 노래했다. 이 시는 권 시인이 ‘술 마시는 人生’이란 글을 통해 “어느 날 밤 나는 오거리의 무대에 올라가 독하게 술 취한 채로 청중 앞에서 이 시를 읊었다”고 회고한 것으로 보아, 술 취한 상태에서 지은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이며 풍자가인 바이런도 ‘인생의 으뜸가는 것은 만취(滿醉)’라고 했다. 평생 술 한 잔 제대로 마셔보지 못했던(술이 받지 않아서) 수필가이자 시인인 피천득(皮千得) 씨는 그런 바이런이 무척이나 부러웠는지 그의 ‘인연(因緣)’에서 “가끔 주정 한바탕 하고 나면 주말 여행한 것 같이 기분이 전환될 텐데 딱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술 마시지 못함을 한탄했다.
어쨌거나 우리는 술을 잘 마신다.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인구의 음주율은 78.5%이며 고도 위험 음주자는 900만 명에 달해, 알코올 남용 및 의존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강력범죄의 10%, 교통사고의 13%, 가정폭력의 23%가 음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20조990억원으로 GDP 대비 2.9%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정부가 금주령이라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러나 술이 인류와 함께 하면서 근절되지 않고 발전을 거듭하는 건 술의 폐해보다 순기능 면이 더 많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것이 현실이라면 이왕 마시는 술을 보다 잘 마셔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술을 잘 마시자고 하는 것은 많이 마시자는 뜻이 아니고 올바르게 마시는 음주 습관을 갖자는 의미다. 외국인들은 “한국인은 관대한 음주문화를 가졌다”고 한다. “한국인은 모이면 마시고, 취하면 싸우고, 헤어진 후 다음날 다시 만나 함께 웃고 일한다”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한국인의 사회적 모임이나 집안 모임에는 술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필요가 있을 때 마시고, 하던 일에서 해방됐을 때도 마신다.
외국인들은 “한국인은 관대한 음주문화를 가졌다”고 한다. “한국인은 모이면 마시고, 취하면 싸우고, 헤어진 후 다음날 다시 만나 함께 웃고 일한다”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한국인의 사회적 모임이나 집안 모임에는 술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필요가 있을 때 마시고, 하던 일에서 해방됐을 때도 마신다.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마셔대면서도 현대인들에게 알맞은 주도(酒道)가 없다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우리 조상들은 ‘향음주례(鄕飮酒禮)’라는 틀 속에서 술을 마실 것을 강조했다. 또 소학(小學)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술에 임하는 예법을 익힘으로써 술로 인한 추태나 분쟁이 거의 없는 풍속의 고장, 예의의 나라였다. 어른을 모시고 술을 마시는 예법에 대해서는 소학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현대인들에게 이를 강조하기란 무리가 있지만 근본이라도 알아두면 자기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술은 개인의 인격을 나타내고 크게는 나라의 정치와 법을 알 수 있는 매개체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의 실학자인 이덕무(李德懋?1741∼93)는 ‘사소절(士小節)’에서 “훌륭한 사람은 술이 취하면 착한 마음을 드러내고, 조급한 사람은 술이 취하면 사나운 기운을 나타낸다”라고 적고 있다.
현대인들도 옛 조상들이 행한 바를 전부 따를 수야 없겠지만 주도의 참뜻을 알고 이를 지켜나간다면 건전한 음주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으리라 본다.
당신은 술 취하면 어떤 마음이 드러나는가. 착한 마음인가, 아니면 사나운 기운이 솟는가. 오늘 밤 한 잔 하면서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글 사진 김원하
교통정보신문 발행인
삶과술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