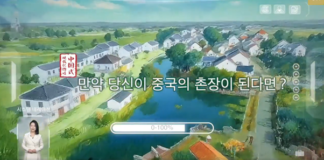형사 피고인이 대선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헌법은 조용했고 정당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 탄압’이라 부르고, 피고인을 피해자라 부른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진영이 헌법 위에 놓이는 현상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형사소추를 제한한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 개인의 정치 보복 방지를 위한 장치였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피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면죄부가 아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실은 오히려 이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단히 결속하고 있다. 그를 둘러싼 5건의 형사재판, 그중 하나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까지 받은 상황에서도, 그 누구도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일부는 침묵하고, 다수는 맹종한다. 이는 단순한 정치 전략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정당의 집단적 무책임이다.
문제는 프레임이다. 이재명을 둘러싼 수사는 ‘검찰의 정치적 기획’으로 치환되고, 유죄 취지 판결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으로 둔갑한다. 심지어 대법원의 결정조차 “정권 눈치 보기”라며 공개적으로 불복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취한 공식적 입장이다.
정당은 왜 존재하는가?
좋은 후보를 검증하고 선출하여 국민에게 봉사할 지도자를 내세우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현실은 어떠한가. 공천의 책임, 도덕의 기준, 후보 검증 시스템은 모두 작동을 멈췄고, 오직 진영 내 결속과 ‘이기기 위한 논리’만 남았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일각에서도 “당의 도덕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실제 공천은 사법 리스크를 안은 채 밀실에서 결정되었다. 법적 위험보다 정치적 동원력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당 전체를 지배했다. 결국 문제는 구조다. 진영 논리가 헌법보다 앞서는 정치 구조, 그것이 오늘의 위기를 만든다.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나는 결백하다”고 말한다. 그 발언을 의심하는 순간, 진영 내부에서는 배신자가 된다. 그렇게 헌법과 법의 판단은 ‘진영’이라는 무기의 먹잇감이 되고 만다.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법 위의 당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역대 어느 정당도 사법 리스크를 안은 인물을 이처럼 ‘정의의 희생자’로 포장하진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과 형사처벌을 거치며 결국 정치적 퇴장을 선택했다. 그 과정에서 보수정당은 최소한의 ‘자기절제’라는 시스템이라도 작동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정반대다. 유죄 취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중심으로 더욱 응집한다. 정당이 권력 보호막이 된 것이다.
지금의 ‘진영 우선’ 구조는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정치가 사법을 지배하는 구조로 이어진다. 이는 단순한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유사한 구조가 반복된다면, 어느 정당이든 헌법과 법 위에 자신들의 정치적 논리를 얹고 정당화하려 할 것이다. 그 끝은 사법의 죽음, 정치의 독점이다.
피고인을 감싸는 논리는 언제나 같았다. “검찰이 문제다”, “정권의 탄압이다”, “수사에 협조했으니 무죄다”, “기소는 정치 보복이다.” 그러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까지 정치 공방으로 둔갑시키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니다.
진영은 중요하다. 그러나 진영이 헌법을 짓밟는 순간, 정치는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지금의 정치 구조는 헌법도, 사법도, 국민도 모두 이기는 게임의 도구로 전락 시켰다.
정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헌법을 지킬 것인가,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진영의 함정에 빠질 것인가?
국민은 그 선택의 끝을 주시하고 있다.
미디어원 l 이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