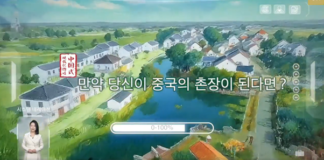김은행 씨(가명)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상속을 준비하며 농협 지점을 찾았다.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서류를 제출하고, 담당자가 정리해준 예금 잔액은 약 8,700만 원. 상속인인 오빠가 이를 수령했다. 그러나 며칠 뒤, 김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기억하고 있던 특정 계좌 두 개가 조회 내역에서 빠져 있었던 것이다.
과거 어머니와 함께 은행에 가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할 당시 받은 전체 계좌 목록 캡처 본이 김 씨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농협 고객센터와 지점, 본점까지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같았다. “여기 일 아닙니다. 본점 확인하세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김 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직접 모든 계좌를 추적해 확인한 결과, 누락된 두 개의 계좌는 ‘잡이익’으로 처리돼 은행 수익으로 회계 전환된 상태였다. 계좌는 살아 있었지만, 장기 정지 상태로 들어간 뒤, 은행은 고객이나 상속인에게 단 한 마디의 고지도 하지 않았다.
잡이익, 그게 뭔가요?
‘잡이익’(雜利益, miscellaneous income)은 회계상 기업의 영업 외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액의 일시적 수익을 뜻한다. 폐품 판매, 통신비 단위 절사 차액, 과오납금 잔액 등 금액이 작고 비정기적이며 본래 수익 항목으로 분류하기 애매한 항목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은행 회계에서조차 ‘잡이익’은 ‘찌끄레기 같은 수익’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들에겐 이름조차 낯선, 사소한 수입 항목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가족의 생애 마지막 예금이다.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이 항목 안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의 유족 예금이 은밀히 회계 처리되고 있다.
묻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는다
잡이익 처리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그 돈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고객이 묻지 않으면 은행은 절대 말하지 않는다.
김은행 씨는 계좌 캡처본이 있었기에 끝까지 추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속인은 계좌번호도 모르고, 은행은 그 사실을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며, 상속 절차상에서도 잡이익 여부는 고지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구조적 침묵이다. 고객이 모르는 사이, 은행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지된 예금이 5년을 넘기고, 법적으로 ‘잡이익’으로 처리할 명분이 생기길.
치매사회, 그리고 사라지는 돈들
김 씨의 어머니는 말년 치매를 앓았다. 자식들이 생활비를 조금씩 모아 드렸고, 어머니는 그 돈을 모아 손주에게 용돈을 주고, 자식이 힘들다 하면 몰래 꺼내주던 분이었다.
은행 입장에선 ‘거래 없는 계좌’였지만, 가족에게는 마지막 남은 정이었다.
이제 한국 사회는 고령화·치매 급증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수많은 계좌들이 장기 미사용 상태로 남겨질 것이다. 그리고 은행은 말할 것이다. “법에 따라 잡이익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묻는다. 법이 사람을 위하지 않는다면, 그건 수단이 아니라 도구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무너진 건 돈이 아니라 신뢰다
농협은 김 씨의 어머니가 남긴 두 계좌를 ‘잡이익’ 처리했다. 수년간 거래가 없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계좌는 해지되지 않았고, 가족은 그 존재조차 몰랐고, 은행은 말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잡이익’일지 몰라도, 고인에게는 마지막까지 간직한 가족의 흔적이다.
무너진 건 단지 돈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다.
2025년 5월 | 미디어원 취재팀 단독기획

![[크기변환]크기변환또변환ftgjfjKakaoTalk_20250516_123030517](https://media1.or.kr/wp-content/uploads/2025/05/크기변환크기변환또변환ftgjfjKakaoTalk_20250516_123030517.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