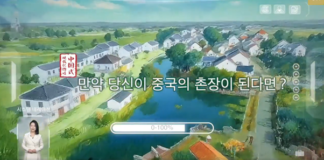지식인을 자처하는 사람이라면 생전에 꼭 읽어야 할 책 가운데 논어(論語)가 있다.
논어 향당편(鄕黨篇)은 주유천하를 마치고 낙향한 후에 ‘공자의 언행과 처신, 그리고 의식주에 걸친 일상생활을 기록한’편으로 작금의 주당이라면 꼭 한 번 읽어 봐야 할 편이다.
물론 향당편에는 현대인들과 맞지 않는 대목 즉, “식사할 때는 이야기하지 않고, 잠들 머리에서도 말하지 않는다(食不語, 寢不語)”는 등의 내용도 있지만 향당편 10장에는 “마을 사람들과 술을 마실 적엔 지팡이를 든 노인이 나가면 곧 따라 나갔다(鄕人飮酒, 杖者出, 斯出矣)”라는 내용은 현대인들이 음미할만한 대목이다.
보통 사람들은 평상시엔 예의도 바르고, 웃어른에게 깍듯하다가도 어느 정도 술이 취하면 위아래 몰라보고 주사를 부리기 일쑤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윗감이 인사를 왔을 때, 또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술대접을 하여 술이 취한 상태에서 사람 됨됨이를 관찰하려고 한다.
이미 공자도 “술 마시고 취하지 않았을 때와 같이 행동하기 어렵다”고 간파하여 술자리에서 웃어른을 존경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을 것이다.
고리타분한 이야기 같지만 요즘 술자리를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예컨대 직장에서 상사와 전체 회식이 있을 때 관리자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온 직원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것은 예사요, 술이 취해 상사가 온지도 모르고 시끌버끌 떠드는 일이 다반사로 돼 버렸다. 자리를 뜰 때도 인사는커녕 슬금슬금 하나 둘씩 빠져 나간다.
상사는 그저 돈만 내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우리의 술문화를 그르치고 있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직장 상사에 대한 예절도 없고, 동료들에 대한 예절도 없다. 지성인의 조직체인데도 그렇다. 관리자의 조직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만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
질서와 예절은 그 조직 사회의 품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개인의 행동은 그 직장의 얼굴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불평이 많다. 술좌석 문화는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지킬 줄은 알아야 한다. 그 방법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공자도 엄청난 주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유주무량(唯酒無量)’이라고 했으니 말이다. 말하자면 술을 마시는 것에 있어서는 양을 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니 술을 자주 했다는 것은 명확해진다. 문제는 ‘양(量)’이다.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상대를 괴롭히는 즉, ‘휘둘리는 지경(亂)’까지 마시진 않았다는 것이다. 바로 ‘불급란(不及亂)’ 할 줄 알았던 것이다. 즉 주사를 부리진 않았다는 그런 얘기다.
명심보감(明心寶鑑)에도 “술 취한 가운데도 말이 없음은 참다운 군자요, 재물에 대하여 분명한 것은 대장부”(酒中不語는 眞君子요, 財上分明은 大丈夫라 己篇)라고 했다.
요즘은 술좌석에서 말이 많아 신분상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많다. 해야 할 말은 평상시에 하는 것이 유익하다. 할 말은 하되 장소와 때를 분간할 줄 알아야 한다. 말로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술 먹고 하는 말은 술좌석에서 끝나야 한다.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된다. 술만 먹으면 말이 많은 사람, 술만 먹으면 주정을 부리는 사람, 어느 곳에서나 환영을 받지 못한다.
사기(史記)에도 하늘에 제사 지내고 사당에 제사를 올리는 데는 술이 아니면 제물을 받지 않을 것이며(郊天禮廟는 非酒不享이요), 임금과 신하, 친구 사이에도 술이 아니면 그 의리가 돈독해지지 않을 것이요(君臣朋友는 非酒不義요), 싸움을 한 후 서로 화해하는 데도 술이 아니면 서로 권유하지 못할 것(鬪爭相和는 非酒不勸)이라 했다.
그래서 술은 성공과 실패가 있으니, 이를 마시되 함부로 음주해서는 안 되니 조심해서 마셔야 하느니라(故로, 酒有成敗而不可泛飮之니라)고 한 것을 봐도 술을 잘 먹어야 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매 한가지다.
현대 사회에서 술로 인한 갖가지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술을 시작할 때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술문화를 제대로 가르쳐 줄 것인가. 성인들의 주도를 따라할만 하지 않는가.
글 사진: 김원하 편집위원
삶과 술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