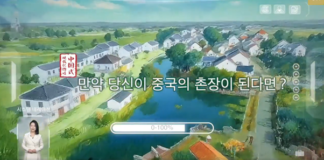중국이 만리장성을 찾은 관광객들이 "나 홍길동 여기 왔다 가노라!" 식의 낙서를 해도 문제 삼지 않을 모양이다.
그 동안 무분별한 낙서로 장성 벽의 훼손이 말이 아니었고, 해외 문화재까지 낙서를 해대는 통에 이만저만 골치거리가 아니었는데 아무리 못하게 한들 요리조리 피해가는 낙서꾼을 근절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었던 모양이다. 그래선지 당국에서는 아예 만리장성의 일부구간을 낙서가 가능한 곳으로 설정해서 관광객의 욕구를 해소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는 차이나데일리의 보도가 나왔다.
그런데, 낙서는 예나 지금이나 유람객이나 풍류가들이 늘상 했던 유희의 하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주변의 명산대천의 계곡과 바위마다 명사들의 시판이나 명구가 새겨진것을 많이 보게 된다. 옛사람들은 아예 솜씨좋은 석공까지 동원해서 … 이름 남기기를 그치지 않았으니 말이다.
몇해 전엔가 답사팀을 이끌고 중국 요녕성 북진시에 있는 의무려산에 올랐다. 의무려산은 동북지역의 명산이고 우리에겐 담헌 홍대용선생의 <의산문답>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명산이다. 한참 경관을 둘러본 후 다음장소로 이동하러 아래로 내려갔는데, 일행 중의 한 분이 한쪽에 쭈그려 앉아 망해정 난간 벽돌에 뭔가를 쓰고 있었다. 다가가서 가만히 보니 작은 칼로 자기의 이름 석자 ‘김.개.똥’을 새기는 중이었다. 애써 말려보긴했지만 그 결연한(?)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중국까지 여행와서 이름 석자 남기려는 문화는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라는 생각이 들어 웃고 말았던 기억이 있다.
과거에도 조선의 사신단에 참여했던 많은 문인.선비들이 연행길의 명소에 들러 이곳저곳에 이름을 남기곤 했다. 북경 천단 인근의 법장사 백탑이 그렇게 유명했기로 사행들은 유람차 들러 8층 벽면에 글들을 남겼다. 그러면 그 후에 사행을 가는 이들은 선배들이 남긴 글을 확인하러 그 장소를 다시 찾곤 했으니 그 행위와 공간의 의미가 남달랐음이다. 아쉬운건 선인들의 행적이 묻어있는 그 공간과 유적은 사라지고 기록으로만 전할 뿐이라는 것이다. 하긴 그런 사연이 어디 법장사 뿐일까마는 ……
기왕에 만리장성 낙서 얘기가 나왔으니, 우리의 연암 박지원선생 얘기 한마디 안할 수 없다. 만리장성에 이름 남기기의 원조격은 아무래도 연암이 아닐까 한다.
1780년 건륭 70세 생일 축하사절로 연경을 향한 그는 북경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황제가 머무르고 있는 열하로 급히 가게 되었는데, 지나던 마을이 고북구였다. 고북구는 만리장성이 지나는 곳으로 북경 방어의 길목이다. 그래서 늘 병가의 요충지로 이름높은 곳이다. 한밤중에 고북구장성을 지나던 연암은 성벽아래에 멈춰서서 단도를 꺼내어 벽돌에 낀 이끼를 걷어내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는 창대에게 연암은 "대장부가 만리장성까지 왔는데 뭐 한가지라도 남겨야 하지 않겠느냐!" 한다. 이내 술 한모금으로 먹을 갈아 글을 새겼으니, "건륭사십오년경자유월칠일삼경조선박지원과차"였다. 새긴 글을 풀면 "건륭45년 6월7일 밤 삼경에 조선의 박지원 이곳을 지나간다." 정도 되겠다. (사진은 OUN제작 다큐 내용중.)
중국에선 ‘부따오장청페이하오한-만리장성에 오르지 않으면 장부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젠 장성에 올라 이름석자 당당히 새기고 올 사람들 많아지겠다.
글: 신춘호 교수 역사여행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