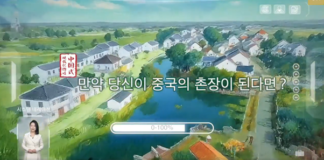세계경제포럼 (WEF) 이 6 일 , 최신 ‘ 세계여행 · 관광 경쟁력 보고서 ’ 를 발표했다 .
전 세계 141 개국의 관광경쟁력 지수를 분석하여 발표한 ‘2015 년 세계 여행관광경쟁력 보고서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15)’ 를 보면 , 한국의 경쟁력 순위는 2013 년 25 위에서 2014 년 29 위로 주저앉았다 . 그동안 중국관광객 덕분에 외래관광객 총량이 급신장함에 따라 관광경쟁력이 높아진 줄 착각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
물론 관광경쟁력은 단기간에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 .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관광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탄탄한 관광산업 생태계 , 즉 지속가능한 관광성장 기반을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관광대국으로 진입하기 어려울 것이다 .
‘2015 년 세계 여행관광경쟁력 보고서 ‘ 에 나타난 세계관광대국 10 개국은 모두 전통적인 선진국들이다 . 그런데 순위에는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 2011 년 , 2013 년과 2015 년을 비교해 보면 , 그동안 스위스가 앞전 두 번에 걸쳐 계속 1 위를 기록하였지만 6 위로 내려섰으며 2015 년에는 스페인이 1 위로 올라섰고 프랑스가 독일을 제치고 2 위를 차지하였다 .
주목해야 할 점은 한 · 중 · 일 3 국간의 희비가 엇갈렸다는 것이다 . 일본은 2011 년 22 위에서 2013 년에는 14 위로 올라서더니 금년에는 9 위로 견고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중국은 2011 년 39 위에서 2013 년 45 위로 내려갔다가 2015 년에는 17 위로 급상승한 반면 , 한국은 2011 년 32 위에서 2013 년 25 위로 올라섰다가 금년에 다시 29 위로 뒤쳐졌다 . 결국 한국의 경쟁력 순위만 뒤처졌고 , 가장 낮은 경쟁력 순위를 보인 것이다 (< 표 1> 참조 ).
< 표 1> 한 · 중 · 일 3 국의 관광경쟁력 추이
요즘 같은 변화무쌍한 시대에 세계관광 경쟁력 순위가 4 계단 떨어진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내에서조차 2013 년 6 위에서 2015 년 9 위로 3 계단이나 떨어졌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 결국 우리의 관광경쟁력 랭킹 저하는 역내 국가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
우선 관광경쟁력 지수의 4 대 지표를 살펴보면 , < 표 2> 와 같이 ‘ 합법적 환경 ‘ 지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대등하거나 우수한 특징을 보이고 있지만 , 나머지 ‘ 관광정책 ‘, ‘ 관광인프라 ‘, ‘ 관광자원 ‘ 지표는 상대적으로 낮음을 볼 수 있다 . 즉 관광에 포괄적인 영향을 주는 합법적 환경지표보다는 관광과 직접 관련된 나머지 세 가지 지표들이 경쟁력 랭킹을 결정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한국의 경우 , 14 개 세부지표를 보면 보건 및 위생 (6.36 점 ) 만 6 점대로 나와 선전했을 뿐이며 자연자원 (2.34 점 ), 국제개방성 (3.60 점 ), 환경적 지속가능성 (3.86 점 ) 등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14 개의 세부지표가 모두 우수할 수는 없지만 상위권 ( 경쟁력 ) 국가의 경우 모든 세부지표의 지수가 골고루 상위에 랭크되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 많지는 않지만 우수한 지표를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우리가 자주 활용하는 SWOT 분석의 관점에서 볼 때 , ‘ 약점의 보완 ‘, 그것도 획기적 보완에 관광정책의 방점을 찍어야 한다 .
< 표 2> 아시아태평양 주요국가의 관광경쟁력 지수 비교

금년도 세계관광경쟁력 지수의 산출은 측정지표의 구성부터 종전과 큰 차이점을 보였다 (< 그림 1> 참조 ). 과거에는 (1) 관광규제 틀 , (2) 경영환경과 인프라 , (3) 인적 문화적 자연적 관광자원 3 개 지표 14 개 세부지표로 점수를 산출했으나 , 이번에는 14 개 세부지표의 수는 유지한 채 대 ( 大 ) 지표를 (1) 합법 환경 , (2) 관광정책 여건 , (3) 관광 인프라 , (4) 자연ᆞ · 문화 자원으로 1 개 더 늘리고 세부지표를 유형별로 재구성하고 있다 .
그 결과 2013 년 1 위였던 스위스의 평균 경쟁력 지수는 5.66 점이었으나 금년 1 위인 스페인은 5.31 점으로 줄었다 . 2013 년 25 위였던 한국의 지수는 4.91 점으로 1 위와 0.75 점 차이가 났다 . 그런데 이번 2015 년 한국의 지수는 4.37 점으로 1 위인 스페인의 5.31 점보다는 0.94 점이나 차이난다 .
관광경쟁력의 랭킹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 그보다는 시대가 변하면서 관광경쟁력 지표에서 어떤 요소들이 중요시되는가를 주시하고 , 우리의 취약점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 그리고 우리가 안고 있는 취약점을 관광 부문에서 자체적으로 해소하기 곤란하다면 범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논의해야 한다 .
< 그림 1> 관광경쟁력 지수의 지표구성 변화

향후 한국이 세계관광 경쟁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앞서가는 누군가를 제쳐야 할 것이며 , 또한 누군가를 본받으며 뒤쫓아 가야 할 것이다 . 특히 일본이 밟아가고 있는 궤도를 잘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 일본은 2011 년 22 위에서 2013 년 14 위로 올라서고 또다시 2015 년에는 9 위에 랭크되어 있다 .
일본 관광경쟁력의 수직 상승은 부럽기도 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 2006 년 관광입국추진기본법 제정 , 2007 년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 수립 · 시행 , 2008 년 관광청 발족 , 그리고 지속적인 방일관광캠페인 (VJC) 전개 등 그동안 축적된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
우리는 관광경쟁력 세부지표 14 개중 10 개 지표가 아태 지역 평균 지수를 넘어섰으나 그중 4 개 정도는 평균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 따라서 우리는 ‘6 강 4 중 4 약 ‘ 현상을 보이고 있다 . 그런데 일본은 가격경쟁력을 제외한 13 개 세부지표가 아 · 태 지역 평균을 넘어서고 있다 . 즉 ’13 강 1 약 ‘ 이다 (< 그림 2> 참조 )
결과적으로 한국은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많이 가지고 있는 셈이다 . 그리고 한일간 경쟁력 지수를 비교해 보면 14 개 지표 중 ‘ 가격경쟁력 ‘ 과 ‘ 관광서비스 인프라 ‘ 만 일본을 앞섰을 뿐 나머지 12 개 지표는 모두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 그림 2> 한 · 일간 관광경쟁력 비교

이에 따라 관광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광부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며 , 그중에서도 ‘ 선택과 집중의 원칙 ‘ 을 세워 집중 투자할 분야를 잘 선정해야 한다 . 특히 경영환경 , 국제적 개방성 , 가격경쟁력 , 환경적 지속가능성 , 관광서비스 인프라 , 자연 관광자원 분야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가 필요하다 .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한 개방성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 그리고 외래관광객을 위한 수용태세 개선 노력을 한층 더 확대하면서 , 동시에 증가하는 외래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 또한 한류나 쇼핑 관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온 자연 · 생태 및 레저 · 스포츠 관광자원의 지속적 발굴과 상품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 그리고 지역주민의 관광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글: 장병권/호원대학교 호텔관광학부 교수 새만금관광연구센터 소장
글: 장병권/호원대학교 호텔관광학부 교수 새만금관광연구센터 소장
한국관광학회 부회장 겸 관광자원개발분과학회 회장
한양대학교 관광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졸업(문학박사)
pkchang@how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