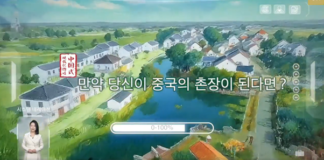제도화된 호칭, 구조화된 혐오
한국은 2025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러나 고령사회로의 진입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노인’이라는 단어 하나로 65세 이상 모든 인구를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단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다.
‘노인’은 국가가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만든 분류 코드이며, 시민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언어적 장치다.
‘노인’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과 함께 공식 제도 용어로 고착됐다. 그 기준은 65세였다.
초기에는 기대수명 67세, 은퇴 연령 60세라는 맥락에서 제도 설계가 타당했을 수 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6세, 은퇴 후 노동 가능 연령도 70세에 육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이라는 단어는 변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정책은 왜곡되었고, 언어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노인복지’, ‘노인무임승차’, ‘노인일자리’라는 표현은 존엄이 아닌 의존, 주체가 아닌 비용으로 이들을 명명한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한 연간 비용은 약 3,700억 원 수준이다.
그 중 97%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해당하며, 이 수치는 매년 언론을 통해 ‘노인의 부담’으로 반복된다.
그러나 국민 전체 교통예산 대비 비율은 4%를 넘지 않는다.
작은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프레임이 ‘노인 혐오’의 공적 근거로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은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다.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은 13% 수준이지만, 한국은 2023년 기준 36.4%로 압도적 1위다.
그럼에도 ‘기초연금 과잉’이라는 표현은 정치권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 모든 오해의 기저에는 ‘노인’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나이만을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고, 정책적 수혜 여부로 인격을 정리한다.
그 안에는 삶의 다양성, 기여도, 건강, 노동 이력은 반영되지 않는다.
정치권은 이 단어를 이중적으로 사용한다.
선거철에는 ‘어르신 표심’이라는 말로 접근하고, 예산 시즌에는 ‘노인 혜택 과잉’이라는 명분으로 정책을 축소한다.
그 과정에서 정책 결정은 숫자와 비용, 즉 ‘부담 계산’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에 대해 일부는 묻는다.
“단어 바꿔서 뭐가 달라지냐고?”
그러나 언어는 단지 이름이 아니다. 언어는 권력이다.
‘노인’이라는 단어가 반복될수록, 그 단어가 지칭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이미지로 고착된다.
실제로 미국은 ‘elderly’라는 단어 사용을 줄이고, ‘older adults’, ‘senior citizens’ 등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했다.
일본 역시 ‘노인(老人)’ 대신 ‘고령자(高齢者)’라는 용어를 제도화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언어는 인식과 태도를 만든다는 점에서, 국가의 복지 철학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65세 활동가 이 모 씨는 말한다.
“주 3일 강의 나가고, 유튜브도 합니다. 근데 뉴스에서는 제가 혜택만 받는 ‘노인’이래요.
그 단어가 주는 기분,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제는 그 단어를 성찰할 시점이다.
‘노인’이라는 말은 더 이상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것은 국가가 만든 분류표의 잔재이며, 정치와 행정이 만들어낸 낙인의 언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단어 하나로 한 세대 전체의 존재를 간편하게 지워왔다.
기획의 시작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노인을 위한 복지를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는 과연 그들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는가?
그 호칭이 바로 이 사회의 시선이며 태도다.
미디어원 ㅣ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