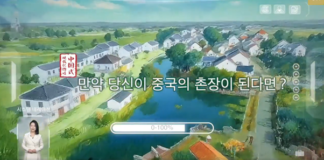“고객님,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대한민국 금융권이 책임을 회피할 때마다 꺼내는 만능 면죄부다.
그러나 지금은 종이통장과 인감도장이 오가던 20세기가 아니다.
모든 거래가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1원의 송금도 즉시 알림이 뜨는 디지털 금융 시대에,
은행과 카드사가 여전히 약관을 방패로 삼는다면 — 그것은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기만이다.
10,312달러의 진실 — 싸인한 금액은 그대로였는데, 청구액은 달라졌다
IBK카드로 해외에서 10,312달러를 결제했다. 당시 환율은 1,415.5원. 영수증에도, 결제 화면에도 그 외의 금액 표시는 없었다. 그러나 며칠 뒤 청구서에는 마스터카드 국제 수수료, IBK카드 해외이용 수수료, 그리고 매입 시점 환율이 덧붙은 금액이 조용히 청구됐다. 고객은 10,312달러만 결제했다고 믿었지만, 실제 청구 금액은 환율 변동과 수수료가 더해져 40만 원 이상 높았다.
IBK카드 문자 알림에는 ‘승인금액’만 찍혀 있었고, “해외 이용 수수료 1.18%, 환율 변동분 추가 예정” 같은 안내는 어디에도 없었다. 민원을 넣자 은행은 말했다. “약관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언제, 어디서 그 약관을 실제로 본 적이 있단 말인가.
약관은 소비자를 위한 장치가 아니다 — 은행의 방패다
은행과 카드사는 모든 불리한 조항을 약관 속에 숨긴다.
소비자가 읽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고지했다”고 주장한다.
그 약관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소송 방어용 문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는 금융기관이 거래조건, 수수료, 위험 등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해할 수 있도록’이라는 말은 단순히 문서에 적으라는 뜻이 아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이용자가 전자거래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카드 결제 승인 문자에 수수료와 환율 정보가 빠져 있다.
고객은 돈을 낸 뒤에야 자신이 얼마를 냈는지를 알게 된다.
이것이 ‘디지털 금융 혁신’의 실체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다,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은행과 카드사는 초정밀 데이터 시스템을 갖고 있다.
결제 승인과 동시에 서버는 환율·수수료·브랜드 비용을 실시간으로 계산한다.
그 정보를 문자 한 줄로 안내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이미 가능하다.
그러나 그들은 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유리, 금융기관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고객이 환율 차이와 수수료 구조를 정확히 알게 된다면, 은행과 카드사는 그동안 누려온 불투명한 수익 구조를 잃는다.
결국 ‘고지 부재’는 단순한 실수나 관행이 아니라, 의도된 불투명성이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철학의 문제, 즉 윤리의 문제다.
약관의 시대는 끝났다 — 디지털 금융의 신뢰는 투명성에서 시작된다
1원의 입출금에도 실시간 알림이 뜨는 세상이다.
그런데 수천만 원대 카드 결제에서는 환율도, 수수료도, 청구 시점도 모른 채 돈이 빠져나간다.
은행과 카드사가 ‘디지털 혁신’을 외친다면, 이제는 기술을 소비자 감시에 쓰지 말고 투명한 고지 시스템 구축에 써야 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감추는 디지털화는 혁신이 아니다.
디지털 사기다.
문자 알림 한 줄이면 된다.
“본 거래에는 브랜드 수수료(약 1%) 및 카드사 수수료(0.18%)가 부과되며, 환율은 승인 시점과 매입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넣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 소비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감독기관, 이제는 움직여야 한다
이제 공은 정부와 감독기관으로 넘어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회 정무위원회는 ‘설명했으니 끝’이라는 구시대적 논리를 법으로 끝내야 한다.
지금의 전자금융거래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원칙만 있고, 디지털 환경에서 언제·어떻게 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
그 빈틈이 은행과 카드사의 회색지대를 낳았다.
이제는 명문화해야 한다.
“디지털 금융거래에서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수수료, 환율, 거래조건 등을 실시간으로 고지해야 한다.”
이 한 문장이 추가되는 순간, 수십 년간 소비자를 불리하게 만들어온 ‘약관 면책 구조’가 깨진다.
그날이 오면 은행은 더 이상 약관 뒤에 숨지 못하고, 카드사는 고객의 눈앞에서 공정하게 거래해야 한다.
법은 기술을 따라가야 한다
기술은 이미 가능하다.
결제 승인과 동시에 서버는 모든 데이터를 알고 있다.
그러나 법은 여전히 종이 위에 멈춰 있다.
법이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면, 기술은 결국 법을 비웃는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 세 가지를 해야 한다.
① 전자금융거래법에 ‘실시간 고지 의무’ 신설,
②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이해 가능성 기준’ 명확화,
③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으로 해외결제 수수료·환율 실시간 안내 의무화. 이것이 진짜 디지털 혁신이다.
금융의 윤리, 이제는 ‘설명했느냐’가 아니라 ‘이해시켰느냐’로
‘약관에 있다’는 말은 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다.
디지털 금융의 본질은 실시간성,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이다.
이 세 가지가 빠진 혁신은 혁신이 아니라 편의 뒤의 함정이다.
“법은 금융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이정찬 발행편집인
미디어원 themedia1@naver.com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설명의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이용자의 확인)
📍 미디어원 경제팀 취재정리